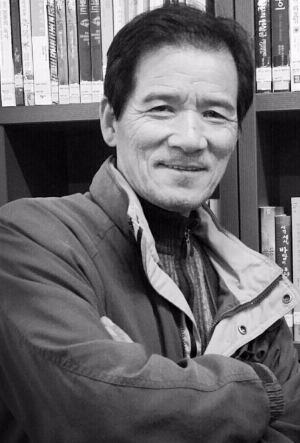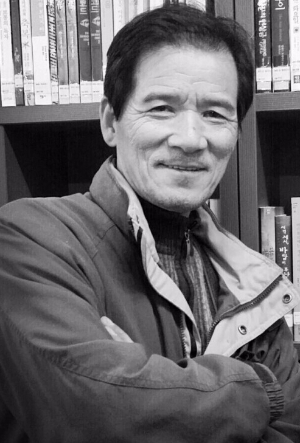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인가의 낮은 지붕 위로 밤나무가 주먹만 한 밤송이를 주렁주렁 매단 가지를 늘어뜨렸다. 골바람에 벌어진 밤송이 사이로 보이는 붉은 아람이 탐스럽다. 북한산 둘레길 중 왕실묘역길이 끝나고 도봉옛길의 시작점이기도 한 무수골을 오르는 길은 편안하고 고즈넉하다. 주말엔 제법 사람들이 오가지만 평소엔 한가로이 숲길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걷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면 ‘툭툭’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골짜기를 타고 온 바람이 청량감을 더해준다.
다리를 건너 성신여대 난향별원을 지나 윗무수골에 이르는 길은 하나의 커다란 나무로 된 터널 같다. 아름드리 양버즘나무를 비롯하여 길 양편으로 울울창창 들어선 나무들이 만든 숲 그늘을 지나면 투명한 가을볕 아래 벼 이삭이 영글어가는 ‘무지개 논’이 마치 고향의 들판처럼 펼쳐진다. 무지개 논은 초등학교 아이들의 생태체험장이다. 내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논이다. 아직은 황금물결을 볼 수 없지만, 곧 이 작은 들판에도 가을빛이 내려앉을 것이다. 논 옆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숲 위로 우뚝 솟은 도봉의 암봉들이 마을을 굽어본다. 나무 그늘에 앉아 냇물 소리를 배경 삼아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속에 품고 온 근심이 저절로 사라질 것만 같다.
논두렁을 따라 ‘무지개 논’ 둘레를 천천히 걷는다. 밤나무 아래엔 밤송이들이 떨어져 뒹굴고 계곡을 따라 보랏빛 개미취와 쑥부쟁이도 보이고 논두렁엔 강아지풀과 자잘한 여뀌꽃들이 피어 있다. 텃밭엔 배추가 자라고 쇠어 버린 부추밭엔 흰 부추꽃도 피었다. 바쁜 도회지 생활 속에 우리는 곧잘 계절을 잊고 산다. 우리가 잊고 사는 사이에도 자연의 시간은 물처럼 흘러 어느덧 우리를 가을 앞에 세워놓는다. 꽃들은 소리 없이 자리바꿈을 하고, 우리가 어여쁜 꽃에 혹하는 사이에 마술처럼 속이 꽉 찬 열매를 우리 앞에 내어놓는다. 내가 숲을 찾는 이유도 숲에 오면 잊고 살았던 계절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곧 숲은 색색으로 물들어 한바탕 축제를 벌일 것이다. 온산을 울긋불긋 단풍으로 곱게 물들이며 천하의 가을을 알릴 것이다. 아직은 푸른 무지개 논의 벼 이삭들도 금빛으로 알알이 영글어 땀 흘린 농부에게 가을걷이의 보람을 한가득 안겨줄 것이다. 봄이 꽃의 계절이라면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다. 추수를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농부의 일만은 아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한 번쯤 인생을 되돌아보게 한다. 혹시 거둘 것 하나 없는 쭉정이 같은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산새도 날아와/우짖지 않고/구름도 떠가곤/오지 않는다.//인적 끊긴 곳/홀로 앉은/가을 산의 어스름/호오이 호오이 소리 높여/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보나/울림은 헛되이 먼 골골을 되돌아올 뿐” 냇가에 앉아 박두진 시인의 ‘도봉’이란 시를 읊조려본다. 가만가만 소리 내어 시를 낭송하다 보면 헛헛하던 가슴이 가을 서정으로 물드는 것만 같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