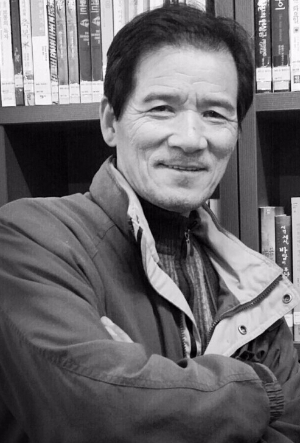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한때 황금빛으로 장엄한 풍경을 연출하던 은행나무와 하늘을 가릴 만큼 무성하던 플라타너스 가로수의 낙엽들이 어지러이 흩어진 보도 위를 걷는 것도 나쁘진 않으나 열심히 낙엽을 쓸어 담는 가로청소원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공연히 미안한 마음이 든다. 장관을 이루는 것도 잠시 낙엽은 도로나 인도에 떨어지는 순간 처치 곤란한 쓰레기가 되기 때문이다. 길거리에 방치돼 더러워진 낙엽은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배수구를 막아 물 빠짐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젖은 낙엽은 보행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마음 편히 낙엽을 밟으며 만추의 정취도 느끼고 사색도 할 겸 가까운 숲을 찾았다. 숲길로 들어서자 밤새 내려 쌓인 낙엽들이 갈색 융단처럼 깔려 있다. 제법 많은 등산객이 지나갔을 터인데 마치 아무도 밟지 않은 것 같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길을 천천히 걸으며 낙엽귀근(落葉歸根)이란 말을 생각했다. 잎은 떨어져서 뿌리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이는 소멸이 아닌 생명의 순환을 의미한다. 비록 낙엽은 소멸하지만 거름이 되어 새로운 잎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겹겹이 쌓인 낙엽은 하나의 층을 이루어 겨울을 나는 곤충들에겐 두텁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준다.
비록 지금은 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며 밟히는 운명이지만 낙엽의 지난 시절은 얼마나 찬란했던가. 겨울빛을 지우며 온 산으로 번져가던 연록(軟綠)의 불길을 상상해 보라. 가지 끝에서 바람을 타며 반짝이던 초록 잎의 눈부신 시절을 떠올리면 낙엽을 밟는 발걸음이 조심스럽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발밑에 들어 제 몸을 부수며 뿌리로 돌아가는 낙엽의 행로는 거룩하기까지 하다.
삶이란 툇마루에 잠시 머물다 가는 햇볕과 같다. 성경 말씀에도 ‘해 아래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낙엽은 낮은 곳으로 내려앉으며 목숨 지닌 자의 숙명을 온몸으로 시연해 보여주며 겸손하라 무언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만 같다. 죽음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라면 이 세상을 떠나는 나의 마지막 모습은 사뿐히 바닥으로 내려앉는 낙엽처럼 떠날 수 있기를,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소망하게 된다.
낙엽이 보료처럼 깔린 숲길을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오며 류시화의 산문집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의 한 문장이 생각났다. 그는 명상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고 했다. ‘내가 가능한 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갖기를. 만약 내가 이 순간에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면 친절하기를. 만약 내가 친절할 수 없다면 판단하지 않기를. 만약 내가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면 해를 끼치지 않기를. 그리고 만약 내가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없다면 가능한 한 최소한의 해를 끼치기를.’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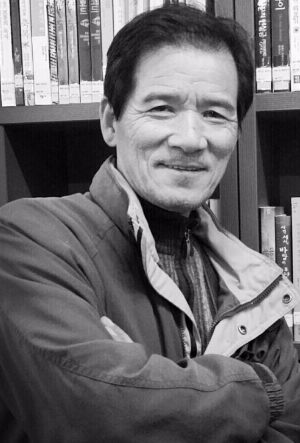


























![[서울모빌리티쇼] 넥쏘·PV5·제네시스 컨버터블 콘셉트 등 눈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315445608370112616b072175213103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