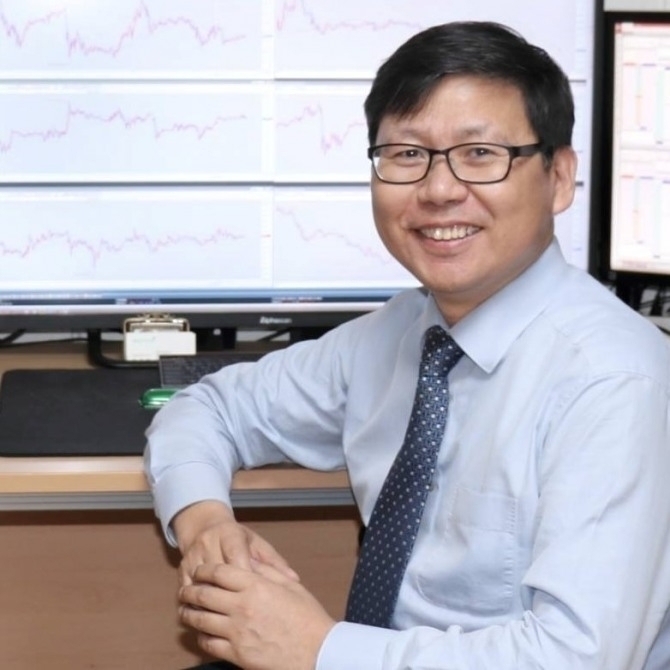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우리금융지주는 18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한다. 전현직 및 내외부 출신 여러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1차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임추위는 최근 헤드헌터회사 두 곳에 '최고경영자(CEO)를 지냈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자'로 후보를 추려 달라고 요청했다. 임추위는 18일 차기 회장 롱리스트를 확정하게 된다.
또한 최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소집한 이 원장은 “경영진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임 되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오히려 관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원론적 이야기로 보이지만 지주사 회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다 보니 간접적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처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우리금융 회장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과거, '관치 금융의 부활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수장이 CEO 인사를 앞두고 경고성 멘트를 던지는 모습이 10년 전 과 너무나 닮은 탓이다. 지난 2013년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거취 관련, "알아서 잘 판단하실 것이다"며 공개적으로 퇴진을 압박했다. "알아서 나가주세요"로 읽힌 이 발언 이후 이 전 회장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용퇴했다.
우리은행 노조도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오랜 폐습을 끊고 시장자유주의 및 공정한 법치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주도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는 이사회 중심의 우리금융 수장 선임 프로세스가 보장돼야 한다"며 관의 개입을 비판했다.
관치금융은 국가가 경제 발전에 나선 초기 단계에선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후 관료들이 관성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도를 넘을 경우 오히려 국가 발전을 후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2003년 카드 사태 때 김석동 금융감독위국장이 내뱉었던 “관은 치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지금도 통용되고 있다. 지금 진행되는 우리금융의 차기 회장 인선을 살피면 더 이상 우리은행 이사회가 보이질 않는다. 존재감조차 미미하다. 이럴 거면 왜 그토록 오랜 기간 힘들게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추진 했는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민영화된 우리금융에서 이사회가 제대도 작동하기 바란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선은 절차 대로 우리금융 주주들의 손에 맡겨야 한다. 그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당국은 이를 지지해주면 된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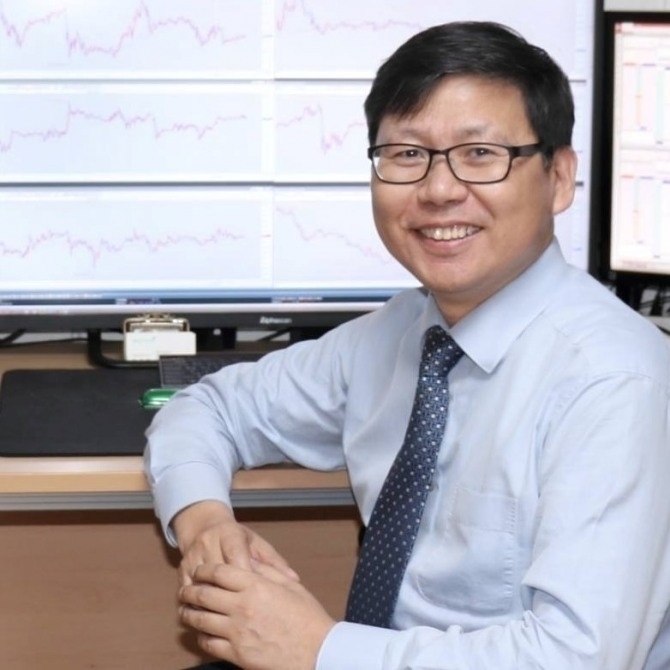


















![[NY 인사이트] AI 폭발 수혜 주목해야 할 데이터센터 관련주 TO...](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4112404454903154e250e8e18858229110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