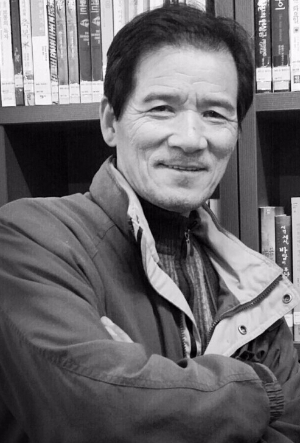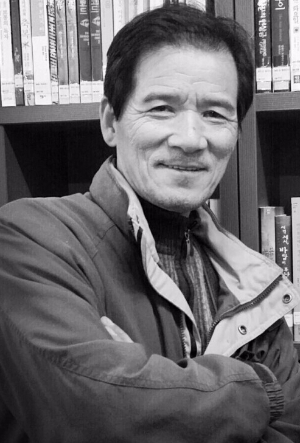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일부-
나이 들수록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이 잦아진다. 일부러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부쩍 고향 나들이가 잦아진 걸 생각하면 나에게도 수구초심, 귀소본능이 작동하는 게 아닌가 싶어 쓴웃음을 짓기도 한다. 어쩌면 그것은 그리움에 싸여 있는 고향이란 이미지가 찬 눈에 덮인 풍경을 보고 따듯함을 느끼는 정서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든다. 상전벽해란 말이 무색하리만치 고향의 풍경도 많이 바뀌었고 인심 또한 예전 같지 않다. 그러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나이 들수록 거부할 수 없는 장력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축석령이란 고개가 하나 있다. 지금은 령(嶺)이란 이름을 붙일 만큼 높은 재도 못 되지만 학창 시절의 내 꿈은 저 고개를 넘는 것이었다. 어두컴컴한 극장에서 존 웨인과 잉그리드 버그먼을 만난 것도, 담배 연기 자욱한 음악다방에서 비틀스와 올리비아 뉴턴 존을 만난 것도, 작은 책방에서 박범신이나 이문열, 백석과 기형도를 만난 것도 그 고개를 넘은 뒤에야 가능한 일이었다. 저 고개를 넘으면 신세계가 펼쳐진다고 굳게 믿었었다. 그때에는.
고향은 더없이 너른 품을 지니고 있다. 어떠한 큰 잘못도 다 용서하고 상처마저 어루만져 주는 게 고향이다. 함께 나이 들어가는 죽마고우들과 웃고 떠들다 보면 세상의 시름쯤은 눈 녹듯 사라진다. 힌디어에는 영어에 없는 ‘안타라야메(Antarayame)’라는 말이 있다. 우리말로 ‘내 마음을 잘 들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내 마음을 판단하지도 바꾸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다. 고향 친구들이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승살이가 힘겹거나 더는 물러날 곳도 없어지면 고향을 찾아간다. 그러곤 힘을 얻어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단지 지리적으로 낯익은 곳은 진정한 고향이라 할 수 없다. 온전히 한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가치가 존중되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인 존재'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온전히 마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진정한 고향'이 아닐까 싶다.
친구들과 눈 내린 고향의 들녘을 걸어가는 동안 마음은 더없이 평온해지고, 내 안을 시끄럽게 하던 소음들이 잦아드는 것을 느꼈다. 눈이 한순간에 세상의 풍경을 흰빛으로 바꾸어 놓듯 고향은 언제나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나 자신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소외되지 않은 온전한 나로 존재하게 해주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다.
백승훈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