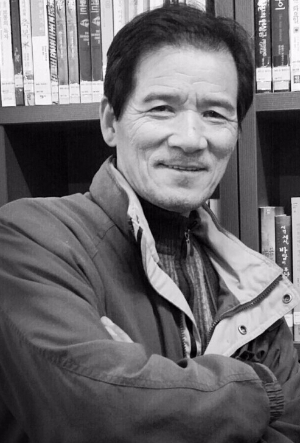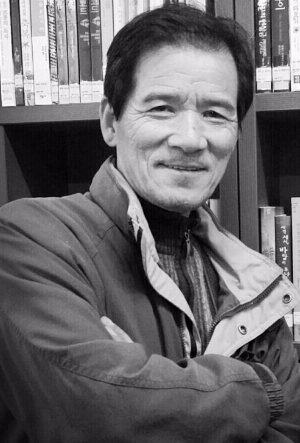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 도시에 모여 살게 되면서 도시의 휘황한 불빛에 가려 달빛도 그 위력을 잃은 지 오래다. 하지만 정월 대보름이 되면 나는 습관처럼 추억에 잠겨 달을 바라보게 된다. 이젠 설날도 예전 같지 않아 고향을 찾아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께 세배를 올리는 모습도 점점 사라지는 추세다. 오히려 연휴를 이용해 유명 관광지나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예전에는 설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는 명절 분위기가 이어졌다. 집안 어른뿐만 아니라 타성바지 어른들께도 세배를 다니기도 했다. 남자들은 모이면 윷놀이를 하고, 여자들은 마당에서 널뛰기를 했다. 아이들은 들판을 뛰어다니며 연을 날리고 정월 대보름이면 어른들은 달집을 태우며 가족들의 안녕을 빌었다.
세시풍속을 잊지 않고 오곡밥을 지어 나누어 먹고, 잣불을 켜며 소원을 빌고, 달집을 태우며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화가 마리 로랑생은 “죽은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잊힌 여자”라고 했다. 비단 여자뿐이겠는가. 잊힌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장 슬픈 일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잊히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거나 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제아무리 선명한 기억이라도 세월의 바람 속에선 색이 바래고 흐려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잊히고 지워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꽃을 보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살면서 중요한 것은 ‘때’를 알아차리는 일이라는 것이다. 꽃 필 때를 놓치면 다시 일 년을 기다려야 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때를 잘 알고 잘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진다. 제아무리 기억력이 뛰어나다 해도 그 많은 사람을 무슨 수로 다 기억하겠는가. 내 나름대로 생각해낸 가장 좋은 기억법은 만나서 함께하는 동안 상대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일부러 꾸미거나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정성을 다해 상대를 대하는 것이다. 꽃이 제가 지닌 향기만큼 허공을 채우듯이 내가 지닌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상대방을 대하면 그 역시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정성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달이 떴다고 전화를 걸어올지도 모를 일이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