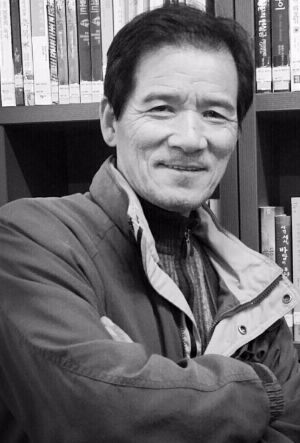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룬 님 오시는 날에 구뷔구뷔 펴리라? 동짓달이 되면 으레 읊조리게 되는 황진이의 시조다. 밤이 낮보다 밝다고 할 만큼 불야성을 이루는 요즘의 도시에서는 황진이의 시가 그리 감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렸을 적만 해도 겨울밤은 유난히도 춥고 길었다. 뒷동산 늙은 소나무에선 부엉이가 처연히 울고 문풍지는 밤새 찬바람에 떨었다. 윗목에 떠다 놓은 자리끼에 살얼음이 끼고 자다가 오줌이 마려워 마당으로 나서면 얼음장 같은 밤하늘엔 눈썹 같은 달이 떠 있곤 했다. 겨울밤 출출할 때 어머니가 화롯불에 데워 주시던 팥죽 한 그릇은 유난히 달고 맛있었던 것 같다.
동지가 지나면 새해가 코앞이다. 다사다난했던 계묘년도 저물어간다. 늘 그랫던 것처럼 되돌아보면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게 더 많고, 성취감보다는 회한이 더 가슴을 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여도 어쩌겠는가. 흐르는 물 같은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이미 늦은 것을. 성찰은 후회하고 자책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난 과오를 거울삼아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시간이다.
마음이 허전할 때는 겨울 숲을 거닐어 볼 일이다. 잎을 모두 떨군 나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가지마다 겨울눈이 돋아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깊은 잠에 빠진 듯 숲은 적요하기까지 하지만 숲은 침묵할 뿐 잠들어 있지 않다. 조선 시대 인파선사는 “樹樹皆生新歲葉 (수수개생신세엽) 花花爭發去年枝 (화화쟁발거년지)” 라는 오도송을 남겼다. 굳이 풀이하자면 “나무마다 새해 되면 새잎이 나지만 꽃은 언제나 묵은 가지에서 핀다.”는 것이다. 미리 준비한 자만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동지가 지나면 해가 노루 꼬리만큼 길어진다고 했다. 남은 날들이 노루 꼬리만큼 남은 세모의 끝자락이다. 이미 놓쳐버린 시간의 화살을 찾아 들판을 헤매기보다는 그동안 소식 없이 지낸 가까운 이웃들의 안부를 묻고 따스한 정을 나눈다면 보다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북극한파가 제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우리의 마음은 동지 팥죽을 먹은 것처럼 따스해 지리라.
백승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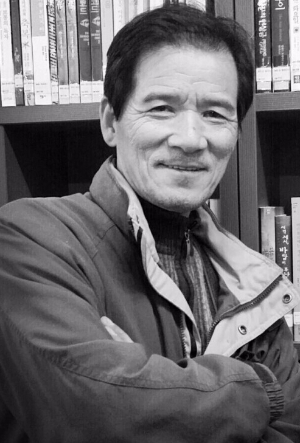
















![[단독] 삼성웰스토리, 베트남서 5억대 세금추징 ‘망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184&h=118&m=1&simg=20241123122843083909a1f3094311109215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