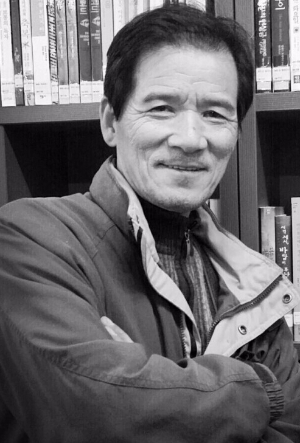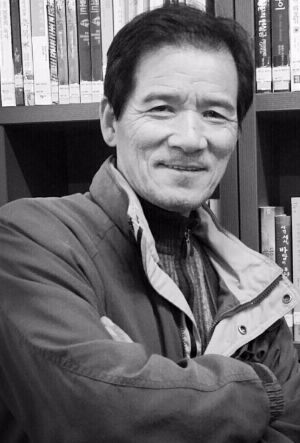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해가 바뀌면서 부쩍 고향 나들이가 잦아졌다. 고향이 수백 년을 터 잡고 살아온 집성촌이다 보니 크고 작은 종중 행사가 많아 새해 들어서는 주말마다 빼놓지 않고 고향에 다녀온 것 같다. 고향에 갈 때마다 나도 모르게 통장 잔고를 어림셈하듯 고향을 찾을 날이 몇 번이나 더 남았을까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곤 한다. 북한산을 바라보며 드는 생각도 다르지 않다. 집을 나서 고개를 들면 어디서라도 바라볼 수 있는 산이지만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저 산을 오를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아직은 체력이 남아있으니 시간만 내면 언제라도 오를 수는 있겠지만 과연 몇 번이나 저 산을 오를 수 있을까 생각하면 산을 바라보는 나의 눈길에도 안개가 서려 온다.
누군가는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하고, 누군가는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했다. 산촌에서 태어나 산과 가까이 살다 보니 나는 자연스레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은 예외 없이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산은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야만 한다. 아무리 가까운 동행이라 해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여서 다분히 의존적이기도 하다. 어쩌면 동행이란 서로에게 마음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걸어가는 일이다. 때로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기도 하고, 좁은 길에선 앞서서 가기도 하고, 쉼터에선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게 동행이 아닐까 싶다.
인도에서는 나이 오십을 ‘산을 바라보는 나이’라고 한다. 지금은 수명도 길어지고 삶의 환경도 바뀌었지만, 예전 농경사회에선 나이 오십이면 자식 키워 모두 출가시키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이니 그런 말이 생겨났으리라. 우스갯소리 중에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다. 쓸데없는 잔소리 하기보다는 좀 더 베풀며 살라는 말이다. 굳이 물질적으로 베풀 수는 없다 하더라도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따뜻하고 그윽해야 한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남에게 베풀지 않으면 마음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
위로(慰勞)의 사전적 의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덜어준다’는 뜻이다. 좋은 위로는 자신의 의도와 입장에서 벗어나 상대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다. 산을 바라보면서 몇 번이나 더 저 산을 오를 수 있을까 생각하듯이 자신의 시선 안에 들어온 누군가를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 상대를 보는 눈길도 절로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질 것이다.
신경림 시인은 ‘산에 대하여’란 시에서 “사람들이 서로 미워서 잡아 죽일 듯/이빨을 갈고 손톱을 세우다가도/칡넝쿨처럼 머루넝쿨처럼 감기고 어우러지는/사람 사는 재미는 낮은 산만이 안다”고 했다. 나이 들수록 몸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독이 된다. 무리하지 않고 힘겹지 않은 산행이라면 바라만 보지 말고 틈나는 대로 시도해볼 일이다. 몇 번이나 더 오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백승훈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