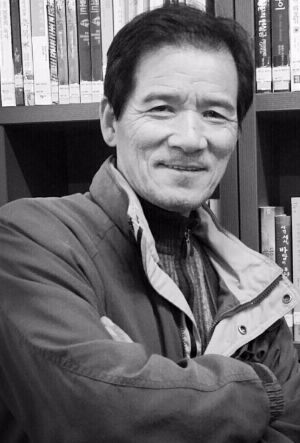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아직은 멀게만 느껴지는 봄빛이지만 겨우내 눈 속에서도 붉은빛을 잃지 않은 청미래 열매처럼
우리가 가슴에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마른 숲속에 알싸한 향기를 흘리며 피어나는 생강나무 노란 꽃을 만나게 될 게 틀림없다. 간절히 원하기만 했을 뿐 아직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했는데 봄이 저만치 와 있는 것 같아 은근히 두렵기도 하다. 일상이 무료해지면 아직은 겨울빛을 간직하고 있는 2월의 숲길을 걷는다. 천천히 걸으며 햇빛이 그리워 남쪽으로 몸이 기운 나무들의 허리를 쓰다듬기도 하고, 일부러 솔잎을 뜯어 씹기도 하며 봄의 기미를 살핀다.
자연과 더불어 살며 주변 풍경의 변화와 마음속 풍경을 달력 속에 그려 넣었던 인디언들은 2월을 가리켜 물고기가 뛰노는 달, 홀로 걷는 달, 기러기가 돌아오는 달, 삼나무에 꽃바람 부는 달이라고 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가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그들이 시처럼 적어 놓은 저 2월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어느 정도는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을 것도 같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골짜기의 물들이 녹아내리며 냇물 속에선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철새들이 자리바꿈을 하고, 물오른 나뭇가지에는 꽃망울이 부풀어 오르는 환절(換節)의 길목이 2월이니 말이다. 인디언들이 세상의 풍경을 읽는 것은 그 풍경 속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자신들을 그려 넣기 위해서였던 게 아닐까 싶다. 긴 혹한의 겨울을 건너서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봄을 맞이할 채비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니 아무런 준비도 없이 봄의 문턱까지 떠밀려온 내가 한심한 생각마저 든다.
거리엔 비가 내리고 먼 산엔 진눈깨비가 내린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집을 나섰다. 잠에서 깨어 무심코 창문을 열었을 때 흰 눈에 덮인 도봉산이 나를 불러낸 까닭이다. 정상까지 오르고픈 욕심을 버리고 둘레길을 걸어 쌍둥이 전망대를 향했다. 흰 눈에 덮인 도봉산과 북한산의 모습은 창문 너머로 보이던 풍경과는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온다. 산을 오르지 않고는 결코 마주할 수 없는 풍경이다. 내가 산행을 즐기는 것은 고도를 높일 때마다 세상의 풍경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평소에 익숙했던 풍경도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보면 예전과 전혀 다른 풍경으로 다가온다. 등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한다.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한다는 점에서 등산은 예술과도 맥이 닿아있다.
문득 김충규 시인의 ‘햇볕에 드러나면 슬퍼지는 것들’이란 시가 생각난다.
“햇볕에 드러나면 짜안해지는 것들이 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에 햇살이 닿으면 왠지 슬퍼진다/ 실내에 있어야 할 것들이 나와서 그렇다/ 트럭에 실려 가는 이삿짐을 보면 그 가족사가 다 보여 민망하다/ 그 이삿짐에 경대라도 실려 있고, 거기에 맑은 하늘이라도 비칠라치면/ 세상이 죄다 언짢아 보인다/ 다 상스러워 보인다// 20대 초반 어느 해 2월의 일기를 햇빛 속에서 읽어보라/ 나는 누구에게 속은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진다/ 나는 평생, 2월 아니면 11월에만 살았던 것 같아지는 것이다.”
다행히 2월의 달력 속엔 아직 내가 쓸 수 있는 날들이 더 남아있다. 2월을 무탈하게 건너 봄에 닿고 싶다.
백승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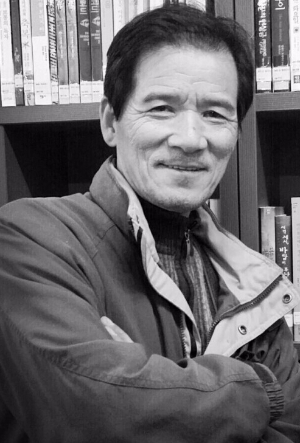
























![[서울모빌리티쇼] 넥쏘·PV5·제네시스 컨버터블 콘셉트 등 눈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315445608370112616b072175213103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