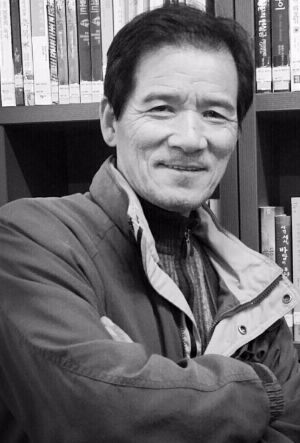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시인 더글러스 맬럭은 “만일 당신이 산꼭대기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의 소나무가 되라. 골짜기에서 제일가는 소나무가 되라. 만일 나무가 될 수 없다면 덤불이 되라. 덤불이 될 수 없다면 풀이 되라. 그리고 만일 풀이 될 수 없다면 이끼가 되라.”고 했다. 바위나 나무에 달라붙어 살며 우리에게 심미적인 즐거움을 주는 이끼는 나무처럼 일어서지도 못하고 가장 낮은 땅에 엎드려 산다. 주로 고목이나 바위, 습지에서 자라는 이끼는 잎과 줄기의 구분도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이끼는 육지에 풀과 나무가 등장하기 이전인 약 4억 년 전부터 등장했으며 현재는 1만600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기엔 하찮아 보이는 이끼지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며 숲의 생태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놀라운 역할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끼는 일종의 스펀지와 같아서 비가 내리면 물을 흠뻑 머금었다가 주변의 식물들에게 나누어주는 물의 공급원이 되어주기도 한다.
이끼 낀 바위틈을 지나 소나무 언덕을 오른다. 바위에 걸터앉아 바닥에 떨어진 솔방울을 바라본다. 유년 시절, 봄이 깊으면 고향 뒷산엔 송홧가루가 자욱하게 날리곤 했다. 그렇게 날린 송홧가루를 받아 수정된 소나무의 암꽃은 단단한 비늘 모양을 이루며 비늘 70~100여 개가 모여 하나의 솔방울을 이룬다. 비늘 사이엔 솔씨가 두 개씩 들어 있다. 솔방울은 비가 오거나 습기가 많은 흐린 날엔 비늘을 오므려 둥근 모양을 하고, 날씨가 건조해지면 비늘 사이를 넓게 벌려 씨앗이 쉽게 날아갈 수 있게 해준다. 소나무가 자신의 씨앗을 멀리 날려 보내려 하는 것은 자신의 그늘을 벗어나야 제대로 된 소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캥거루족'이란 말이 생겨날 만큼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는 요즘 젊은이들은 소나무에게 한 수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3월이라고는 하나 아직은 꽃을 그리기엔 이른 시절이다. 간간이 죽은 나무에 핀 버섯들이 꽃처럼 곱다. 버섯은 숲속의 청소부로 불리는 고마운 존재다. 버섯은 곰팡이와 유사한 균류의 하나로 식물처럼 광합성을 하지 않는 대신 죽은 나무, 죽은 곤충, 죽은 식물 등을 분해해 나오는 물과 영양분을 먹고 산다. 만약에 숲의 쓰레기를 담당하는 버섯이 없었다면 숲길 산책도 유쾌하지만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 숲의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고 고마운 생각이 든다.
산길을 내려오는데 어디선가 숲의 고요를 흔드는 목탁 소리가 들렸다.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찬찬히 살피며 소리의 진원지를 찾았다. 오색딱따구리 한 마리가 나무를 쪼고 있다. 옛사람들이 붉은 잠방이를 입고 얼룩무늬의 비단 띠가 있는 아름다운 새라고 시조로 읊기도 했고, 공작이나 비취새보다도 아름답고 전설 속의 봉황과도 겨룰 만한 고운 빛깔을 가진 새라고도 했던 바로 그 녀석이다. 딱따구리가 저리 열심히 숲을 흔들어 깨우니 곧 봄이 자랑처럼 일어설 게 분명하다.
백승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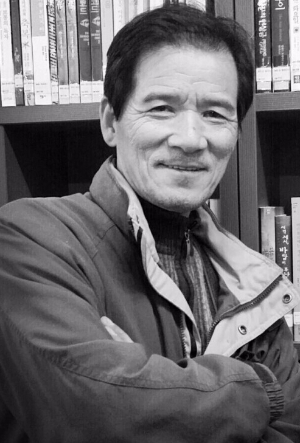






















![[서울모빌리티쇼] 넥쏘·PV5·제네시스 컨버터블 콘셉트 등 눈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315445608370112616b072175213103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