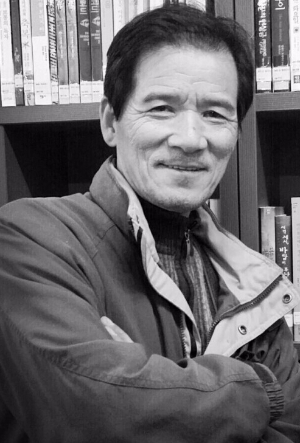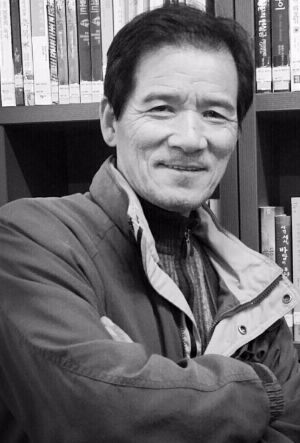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바야흐로 봄이다. 꽃에 굶주린 사람들은 골짜기의 얼음이 녹기도 전에 잔설에 덮인 산속을 헤매며 꽃을 찾아 나서지만 이젠 나같이 게으른 사람에게도 봄꽃들이 눈에 들어오는 요즘이다. 아파트 화단에서 소담스럽게 꽃망울을 터뜨린 산수유는 물론이고 볕바른 담벼락에도 진노랑 개나리가 하나, 둘씩 피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터져 오르는 봄꽃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나의 눈길을 마냥 부산하게 만든다. 봄은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는(見) 때이고, 새로 피어나는 꽃을 보는 계절이다. 일부러 찾아 나서지 않아도 꽃은 눈에 띄게 마련이지만 굳이 꽃을 찾아 나서는 이유는 힘겨웠던 지난 겨울의 칙칙함을 벗어던지고 봄꽃처럼 속없이 환하게 웃고 싶은 바람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른 아침, 산수유나무 아래를 서성이는데 직박구리 한 쌍이 날아와 내 주변을 서성거렸다. 좀처럼 사람에게 곁을 주는 녀석이 아닌데 신기하여 뭐라도 건넬까 싶어 주머니를 뒤져 봤지만 줄 게 없어 서운했다.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직박구리는 산수유 가지에 앉아 잠시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멀리 날아가 버렸다.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지나가 버릴 생이라 했던가. 불현듯 이 봄도 저 새처럼 훌쩍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아 제대로 봄을 즐겨야겠다고 생각했다. 봄을 제대로 즐기는 데 특별한 스킬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면 된다. 봄은 보는 것이다. 그저 새롭게 싹이 트는 것을 보고,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잎이 돋아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면 된다.
연두와 초록이 잘 버무려진 새싹은 그 자체로 빛나는 희망이다. 그 오묘한 생명의 빛을 마주하면 마구 살고 싶어진다. 모든 생명은 주목받길 원한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자연이다. 많은 관심을 받으면 받는 만큼 생존 확률도 높아진다. 사람과 달리 식물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다. 큰 나무는 웅장함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고, 어여쁜 꽃은 향기로 발길을 끌어당긴다. 하지만 정작 지구상의 식물들은 대체로 사람에겐 별 관심이 없다. 식물들은 자신의 삶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수분을 도와줄 곤충이나 새나 작은 동물들에게 관심이 많다. 그리 보면 꽃은 우리에게 공짜 관람권으로 보는 영화처럼 덤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공짜임에도 불구하고 예쁘고 향기로운 꽃을 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행운인가. 꽃을 볼 때마다 고맙기 그지없다.
동네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해찰한다. 화분에 심어진 채로 꽃을 피운 백동백, 볕바른 담벼락에 핀 개나리, 만개한 홍매와 이제 막 터질 듯한 청매를 보았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어린이집 앞에서 가지 가득 눈부신 꽃을 피워 단 살구나무를 보았다. 아직은 벌이 날기엔 바람이 찬데 어쩌자고 저리 성급히 꽃망울을 터뜨렸을까. 바람을 타는 꽃들이 안쓰러운 생각이 들면서도 내 안을 환한 꽃빛으로 채워준 살구나무 아래 서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얼마 전, 들꽃 탐행을 가자고 전화했더니 아직 봄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며 한사코 손사래를 치던 친구였다.
"아니 벌써 살구꽃이 피었다고?" 반신반의하는 친구에게 살구꽃 사진을 전송하고 한 줄의 문자를 추신으로 달았다.
"살구꽃 피는 봄이 찾아왔으니 날마다 살구 싶은 날만 가득하길!"
백승훈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