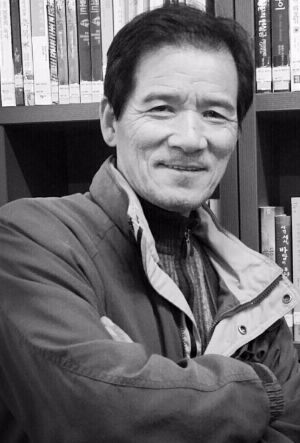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일 년 중 숲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나무들이 가장 왕성하게 물을 길어 올리는 곡우(穀雨) 무렵이다.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초목들이 한껏 물을 길어 올려 꽃과 잎을 피우는 때다. 특히나 꽃들이 흩어진 뒤 돋아나는 새잎들은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잠시 한눈만 팔아도 온통 초록으로 바뀌어 가는 듯하다. 숲에서 자연의 위대한 변신의 순간을 지켜볼 수 있는 때가 바로 요즘이 아닐까 싶다. 연일 하늘을 부옇게 덮고 있는 황사가 외출을 꺼리게 만드는 요즘이긴 하지만 제아무리 황사가 심하다 해도 숲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무한 제공해준다.
나는 딱히 할 일이 없거나 사는 일이 심심하다 싶으면 곧잘 숲을 찾는다. 가까이에 숲이 있는 까닭도 있지만 그보다는 숲에 가면 까닭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거리를 떠나 숲이라는 공간에 머물다 보면 자연이 주는 아늑한 위로와 초록 생명이 뿜어내는 생의 에너지가 나를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준다. 무엇보다 소리 없이 번지는 연두와 초록의 청정한 기운은 세상에 부대끼며 탁해진 내 마음을 정갈하게 씻어준다. 인적 뜸한 봄 숲을 거니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는 일이다. 바람에 살랑거리는 나뭇잎과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은빛 햇살, 코끝을 간질이는 꽃향기와 숲의 풀 비린내를 생각하면 절로 코를 실룩이게 된다.
며칠 전, 산정호수로 꽃구경을 다녀왔다. 강원도와 인접한 곳에 있는 산정호수는 봄이 늦은 편이다. 서울엔 이미 꽃은 지고 연둣빛 새잎들이 꽃 진 자리를 메우며 초록 그늘을 만들고 있는데 호수로 가는 길엔 산벚꽃이 눈부시도록 고왔다. 가로변의 벚나무에도 꽃들이 활짝 피어 뒤늦게 벚꽃 구경을 하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 호숫가엔 평일임에도 산책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 호수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거나 화단에 핀 튤립과 데이지 같은 꽃을 보고 환호하는 사람, 물가의 벤치에 앉아 넋 놓고 물멍을 때리는 사람도 보였다. 적당히 온기를 품은 따뜻한 햇볕과 싱그러움을 더해주는 상쾌한 바람 덕분인지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밝다.
호숫가를 거닐다 유난히 연둣빛 새순이 꽃처럼 예쁜 나무를 만났다. 그 나무는 다름 아닌 물푸레나무였다. 마른버짐이 핀 것처럼 수피에 희끗희끗한 반점이 있는 물푸레나무는 가지를 꺾어 물에 담그면 파란 잉크를 풀어놓은 것처럼 파르스름하게 물빛을 물들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푸레나무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시인이 있다. ‘물푸레나무를 생각하는 저녁’이란 단 한 권의 시집만 남기고 훌쩍 세상을 등진 김태정 시인이다. ‘…가지가 물을 파르스름 물들이며 잔잔히 /물이 가지를 파르스름 물 올리며 찬찬히 /가난한 연인들이 /서로에게 밥을 덜어주듯 다정히 /체하지 않게 등도 다독거려 주면서’(김태정의 ‘물푸레나무를 생각하는 저녁’ 일부)
해남을 여행할 때 그녀를 만나고 싶었으나 용기가 없어 다음으로 미뤘는데 그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영영 만나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꽃이나 사람이나 때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이 좋은 봄날, 연두에 취하지 않는다면 어찌 봄을 즐겼다 말할 수 있겠는가.
백승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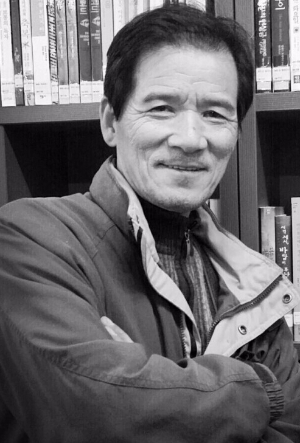


























![[서울모빌리티쇼] 넥쏘·PV5·제네시스 컨버터블 콘셉트 등 눈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315445608370112616b072175213103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