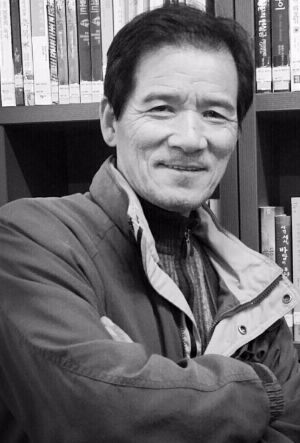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신록에서 진록으로 숲의 색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마음을 기울여 들여다보아야 모든 사물은 제 모습을 더 세밀하게 보여준다고 했던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박제가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다. “‘붉다’는 그 한마디 글자 가지고/ 온갖 꽃을 얼버무려 말하지 말라/ 꽃술도 많고 적은 차이 있으니/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봐야지.” 언뜻 보면 그저 붉게 보일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붉은색도 다양하다. 연분홍, 분홍, 자주, 진홍, 주홍……. 하지만 내겐 노랑과 연두와 초록과 청록이 혼재된 숲이 시시각각으로 바뀌어 가는 모습을 글로 적어낼 재주가 없으니 그저 온몸으로 숲을 즐기는 수밖에. 숨을 들이켜고 내쉴 때마다 비에 씻긴 숲의 청량감이 가슴을 깨끗이 쓸어내는 것만 같다.
부처의 머리를 닮은 불두화가 탐스러운 노적사 앞을 지나 중흥사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태고사를 들렀다. 고려말 고승인 원증국사 보우가 세운 절로 절마당 끝에 180년 된 보호수 귀룽나무가 있다. 조선 후기 지식인으로 간서치(看書癡·독서광)로 불리던 이덕무는 북한산 유람기를 적으며 북한산에 편재해 있는 사찰과 국가 소유의 병영, 성곽 등에 대해 간략하면서도 요령 있게 글을 썼는데 태고사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절의 동쪽 산봉우리 밑에 고려국사 보우(普愚)의 비가 있다. 목은(牧隱) 이색이 찬술하고 권주(權鑄)가 글씨를 썼다. 국사의 시호는 원증(圓證)이고 태고(太古)는 호이다. 신돈(辛旽)이 권세를 잡자 글을 올려 그 죄를 따졌으므로 당시의 임금에게 축출되었으니 불가(佛價)로서 탁월하게 지절(志節)이 있는 자이다. 입적하자 100개의 사리가 나왔는데 부도(浮屠)를 세 개 만들어서 저장하였다.”
비각 옆에서 쪽동백꽃 향기를 흠향하고 다시 산을 오른다. 오월의 숲엔 유독 흰 꽃들이 많다.
키 큰 나무들이 피어 단 흰 꽃들은 숲길을 걸을 땐 바닥에 떨어진 꽃잎을 보고 고개를 젖힌 뒤에야 보기 십상이다. 층층나무와 산사나무, 산딸나무꽃이 그렇다. 거기에 비하면 노린재나무는 키가 크지 않아 쉽게 눈에 띄는 편이다. 백운대를 오를 계획이었으나 만경대 아래 낙석 구간이 생겨 통행이 금지돼 우회하여 진달래 능선으로 방향을 틀었다. 옛 장군의 지휘본부가 있던 동장대를 돌아보고 성곽을 따라 걸으며 만경대와 인수봉, 백운대를 바라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언제 보아도 멋진 풍경이지만 모퉁이를 돌 때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북한산 봉우리의 모습은 산행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진달래 져버린 진달래 능선을 따라 하산하는 길, 국수나무꽃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옛날에는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국수나무꽃을 보고 가까운 곳에 인가가 있음을 알고 안심했을 만큼 국수나무는 인가가 가까운 숲 들머리에 많이 자란다. 산길을 내려서니 다시 계곡의 물소리 살아나고 아카시아꽃 향기가 코를 찔러 온다.
백승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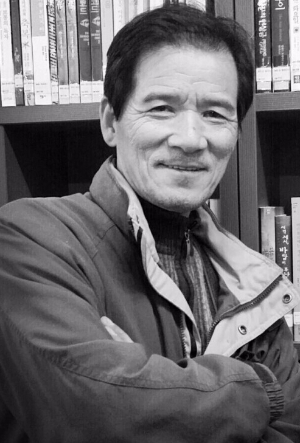


























![[서울모빌리티쇼] 넥쏘·PV5·제네시스 컨버터블 콘셉트 등 눈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315445608370112616b072175213103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