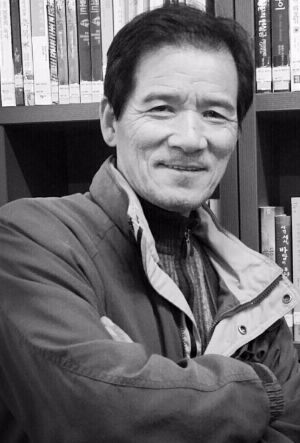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설악산 대청봉을 떠올릴 때마다 부록처럼 따라오는 시가 속초가 고향인 고형렬의 ‘대청봉 수박밭’이다. 이 시를 대청봉을 오르기 전에 알았는지 정확지는 않으나 이 시를 읽으며 정말 설악산에는 여름에도 눈이 내릴까. 대청봉에 수박밭이 있기는 할까. 반신반의하면서도 전혀 사실일 수 없는 두 진술이 거짓말로 들리지 않은 것은 “상상을 알고 있지”라는 구절 때문이었다. 상상은 가능성을 열망하고 창조를 부른다 했다. 마음에 궁기 돌아 허기진 초여름. 고형렬의 ‘대청봉 수박밭’을 가슴에 품고 녹음 짙은 산그늘 밟아 대청봉을 오른다.
대청봉에서 내려오며 물웅덩이를 세다가 백 번째 물웅덩이 있는 자리에 절이 있어 못 담(潭)자를 써서 절 이름을 지었다는 백담사에서 시작된 산행은 영시암을 거쳐, 수렴동 계곡과 구곡담 계곡을 지나 봉정암과 소청대피소에서 배낭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가벼운 색(sack)에 물병 하나 챙겨 대청봉을 오른 뒤 소청대피소에서 1박을 하고 봉정암에서 오세암, 만경대, 영시암을 거쳐 백담사로 돌아오는 코스다. 다소 버거운 산행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대청봉을 오를 수 있을까 싶어 내심 기대가 컸던 것 또한 사실이다. 영시암까지 가는 길은 수렴동 계곡을 거슬러 오르는 편한 길이다. 백담사에서 수렴동대피소까지를 수렴동 계곡이라 부르는데, 계곡물이 주렴을 친 듯 연이어 흘러서 수렴(水簾)이다. 오랜 세월 사람들이 다지고 고쳐 놓아 걷기에 어렵지 않고 녹음 짙은 숲에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은 연신 꽃향기를 실어 나른다.
녹음이 짙어질수록 흰 꽃이 많아진다고 했던가. 함박꽃나무, 개회나무, 눈개승마. 노루오줌, 다래꽃, 쪽동백. 일일이 호명할 수 없는 수많은 흰 꽃이 갈 길 먼 우리의 걸음을 더디게 한다.
골짜기를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들면 천애의 절벽이 앞을 막아서고 계곡을 건너는 다리를 지날 때마다 시선을 압도하는 풍경에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게 마련이고, 깊은 골을 흘러내리는 물은 절벽을 만나면 폭포를 만들고 담(潭)과 소(沼)를 이루며 아래로, 아래로 내려간다.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 봉정암에 이르는 길은 높고 가파르다. 봉정암에 닿기 전 가파른 해탈 고개를 넘는데 등에 진 배낭의 무게가 여간 버거운 게 아니었다. 겨우 하룻밤 양식과 옷가지도 이리 무거우니 우리가 평생 지고 가는 삶의 무게는 어찌 가늠이나 할 수 있을까. 1400년 전 진신사리를 봉안한 자장율사는 이 고개를 넘으며 적멸의 기쁨을 맛보았을지 자못 궁금하다. 소청대피소에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가벼운 색에 물병만 챙겨 대청봉을 향했다.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음에도 해 떨어지기 전에 대청봉에 오르려면 걸음을 재촉해야 할 만큼 시간이 촉박했다.
중청을 지나 대청봉에 이르는 길은 온통 바람의 길이다. 눈잣나무숲을 지나 대청봉 정상에 오르도록 바람은 쉼 없이 불고 바람에 쓸린 초목들은 하나같이 허리를 숙였다. 마침내 바람만이 주인인 설악의 정상 대청봉(해발 1708m)에 나를 세웠다. 그리고 서편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살아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백승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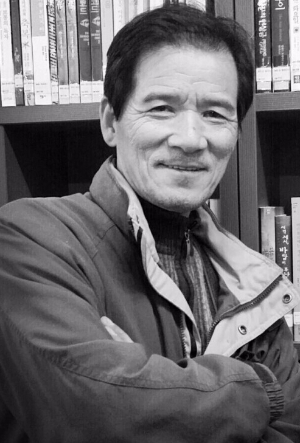




























![[서울모빌리티쇼] 넥쏘·PV5·제네시스 컨버터블 콘셉트 등 눈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315445608370112616b072175213103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