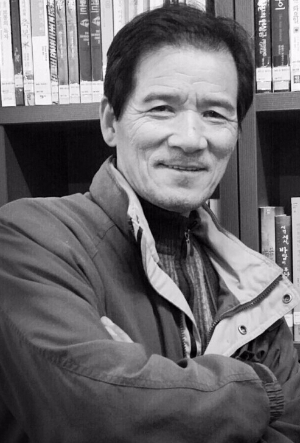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처서가 되면 그악스럽게 울어대던 매미 소리가 잦아드는 대신 밤이면 귀뚜라미 울고 하늘은 조금씩 키를 높이고 산봉우리 위론 뭉게구름이 뭉실뭉실 피어나 시시각각 모습을 바꾸며 눈길을 사로잡는다. 산과 들에선 여름꽃들이 시나브로 지고 가을꽃들이 하나둘 피어나 빈자리를 메운다. 이러한 눈에 띄는 변화보다는 자연의 미묘한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은 바람결이 아닐까 싶다. 한낮엔 불볕더위가 여전히 뜨거워도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결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다. 이 서늘한 기운이 초록 일색으로 짙어만 가던 숲에도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조금씩 조금씩 가을 쪽으로 기울어 가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열대야의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올여름의 더위는 좀처럼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 무덥고 지루한 여름을 보내며 나는 종종 삶은 견디는 것이란 생각을 하곤 한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자전거를 타고 천변으로 나가 라이딩을 즐긴다. 천변의 자전거 도로는 잘 정비돼 있다. 밤바람을 가르며 달리다 보면 천변에 무리 지어 피어 있는 노랑 코스모스와 달맞이꽃들이 엷은 향기를 흘리며 나를 반긴다. 불빛을 받아 반짝이며 흘러가는 강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달리다 지치면 자전거를 세우고 천변에 앉아 쉬지 않고 흘러가는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 조용히 흘러가는 물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다 보면 밋밋한 일상들이 더없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오늘도 한 가지/ 슬픈 일이 있었다./오늘도 또 한 가지/ 기쁜 일이 있었다//웃었다가 울었다가/희망했다가 포기했다가/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그리고 이런 하나하나의 일들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평범한 일들이 있었다.” -호시노 도미히로의 ‘일일초’ 전문- 이 시를 쓴 ‘호시노 도미히로’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다. 체육교사였던 그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시범을 보이다가 다쳐서 목 윗부분만 빼고 전신마비가 되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입에 붓을 물고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뿐이었다. 그의 시는 우리에게 수많은 평범한 일들이 모여 하루를 이루고, 그 평범한 하루가 모여 위대한 삶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비록 무덥고 지루한 날들이라 해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희로애락이 들어있게 마련이다.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강물은 쉼 없이 흘러가고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온다.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이내 쓰러지고 마는 자전거처럼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들에 나가 꽃을 보거나 숲을 찾아 나무의 변화를 살피는 일, 천변에 나가 물새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거나 하늘에 이는 구름을 보는 일도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간절한 소망일 수도 있다. 밋밋하기만 한 평범한 일상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것을 생각하면 새로운 계절의 모퉁이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렌다.
백승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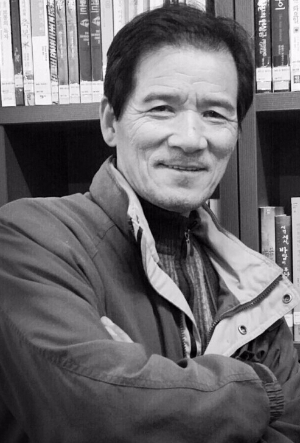





![[뉴욕증시] 中 보복관세 발표에 이틀째 폭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5040505241304089be84d876741182211201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