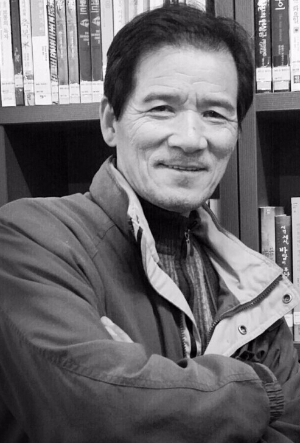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봄은 향기로 오고 가을은 소리로 온다’고 했던가. 조용히 눈을 감고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며 가을의 전언을 듣는다. 눈을 감으면 귀가 열리면서 바람에 실려 오는 다양한 가을의 징후를 읽을 수 있다. 늦은 밤에 들려오는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비롯해 바람을 타는 나뭇잎의 찰랑거림이라든가, 푸른 감이 마당에 떨어지는 소리, 천변의 억새들이 바람에 서로 몸을 부비며 서걱이는 소리, 깃을 치며 날아오르는 철새들의 날갯짓까지… 눈을 뜨고 있을 땐 미처 듣지 못했던 다양한 소리를 통해 가을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바람은 보이지 않으므로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의 변화를 잘 빠르게 전하는 것은 바람이다. 후텁지근한 무더위 속에서도 바람은 조금씩 미세한 변화를 보이며 우리에게 가을을 예감하게 한다. 운동 삼아 저녁마다 천변에 나가 자전거를 타는데 어제 바람이 다르고, 오늘 바람이 다르다. 무어라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르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 미묘한 차이가 여름과 가을이 자리바꿈을 시작했다는 징표라는 걸 나는 직감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세상을 조금씩 조금씩 가을 쪽으로 밀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바람에 계절이 기울며 피워 놓은 꽃들을 본다. 이름만으로도 서러운 분홍색 상사화, 비를 맞아도 함초롬한 순백의 옥잠화,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은 새깃유홍초, 하늘타리, 사위질빵, 박주가리, 벌개미취, 나팔꽃, 노란 달맞이꽃 등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꽃이 가을로 가는 길목에 피어 있다. ‘꽃길만 걷자’고 다짐하지 않더라도 들판에 피어나는 꽃들과 눈 맞추며 걷다 보면 걸어온 모든 길이 꽃길인 것을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다.
“가을은 투명해가는 백합나무 앞에서 온다/ 살며시 고개 숙인 들녘의 벼에게서 온다/ 마당가에 빨갛게 말라가는 고추에서 오고/ 서로 어깨를 기대인 참깨 다발에서 오고/ 조금씩 높아지고 맑아지는 하늘빛에서 온다// 무성한 잎사귀 사이로 얼굴을 드러내며/ 붉은 볼로 빛나는 대추알과 사과알에서 온다/ 봉숭아 꽃씨 매발톱 꽃씨 그 작은 씨앗들이/ 토옥 톡 멀리 퍼져 흙 속을 파고드는/ 소리 없는 희망의 분투에서 온다…” - 박노해의 ‘가을 소리’ 중 일부- 시인은 말한다. ‘가을이 오는 소리는 고요해진 내 마음에 울려 오는 가을 소리’라고.
오랜만에 고향 들녘을 거닐며 가을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 유난히 무덥고 지루한 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열매를 내어 단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대추나무, 들판의 벼 이삭들을 바라보며 가을이 가까이 와 있음을 느꼈다. 이제 바람이 조금만 방향을 달리하면 금세 세상의 풍경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태양을 피해 그늘만 밟아 걷던 발걸음도 양지를 향하고 서늘해진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게 될 것이다. 붙잡아도 여름은 가고 막아서도 가을은 온다. 사람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계절의 순환이다.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연과 맞서는 게 아니라 계절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백승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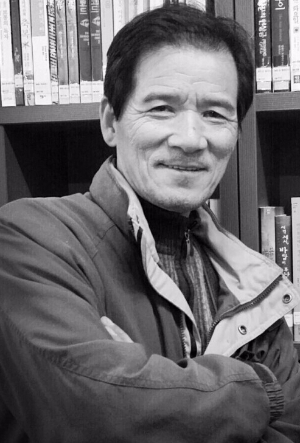





![[뉴욕증시] 中 보복관세 발표에 이틀째 폭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5040505241304089be84d876741182211201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