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내가 죽었다// 세상에 실패하고 주문처럼/ 취생몽사(醉生夢死)를 입에 달고 살더니/ 밤새 참이슬에 흠뻑 젖은 몸/뉘일 자리 찾아 계단을 오르다가/허방을 짚고/ 저승의 문고리를 덥석 잡고 말았네// 하필이면 그날이/ 생이별한 뒤 소식 뚝 끊긴 아들의/ 생일날이었다는 후문// 육십갑자 휘돌아 나오느라/ 상처뿐인 생(生)/ 향 피울 빈소 없어/ 술 한 잔 받지 못하고/ 호곡도 없이 낙엽처럼 흩어져 갈/ 무연고자의 마지막 가는 길// 서녘 하늘 가득/ 비구름이 몰려온다.” -나의 졸시 ‘어느 무연고자의 죽음’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후배를 생각하며 쓴 시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파탄 나는 바람에 가족과도 헤어져 홀로 살던 친구였는데 불의의 사고로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만취한 채 귀가하던 중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다가 그만 허방을 짚고 굴러떨어졌다. 다행히 이웃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저마다 빛나는 열매를 내어 달고 한 해의 성과를 자랑하듯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송년회·동창회 등 이런저런 모임이 잦다. 물처럼 흐르는 시간에 매듭이 있을 리 없으나 사람들은 시간에 눈금을 그어 그동안의 성과를 결산하고 매듭짓길 좋아한다. 팍팍한 일상에 부대끼며 살다 보면 계절이 오고 가는 것마저 잊고 살기 쉽다. 하지만 세모(歲暮)가 다가오면 나무들처럼 자랑스레 내어 달 튼실한 열매가 없다는 사실이 은근히 부끄러워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숲길을 걸으며 눈을 찔러오는 빛나는 열매들과 내 안의 빈 바구니를 견주어 보며 일순, 쓸쓸할 순 있으나 그렇다고 낙담할 일은 아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곧 축복이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갈수록 세월은 가속페달을 밟아대는데 기억은 후진 기어를 넣고 자꾸만 뒷걸음질 친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라. 세월의 속도가 빠르다고 느끼는 것도, 기억이 자꾸만 뒤로 가는 것도 살아있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나무들이 알몸으로 세찬 눈보라를 견딜 수 있는 것도 겹겹으로 싸맨 꽃눈이 새봄이 오면 피어날 것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의 삶이 힘겹다 해도 지레 겁먹고 주저앉을 필요는 없다. 겨울 가면 봄 오듯, 봄이 오면 새순이 돋고 다시 꽃이 피어나듯 살아있으면 좋은 날은 반드시 찾아오는 게 순리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존 F. 케네디는 “가난한 다수를 도울 수 없다면 부유한 소수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울수록 온기가 더 그리워지듯이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정이 그리워지는 게 사람이 아닐까 싶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을 나누는 일도 소중하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외롭고 병든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올겨울은 자신보다 많이 가진 자를 시기하기보다는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정을 나누는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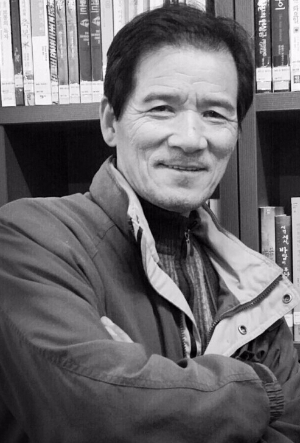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백승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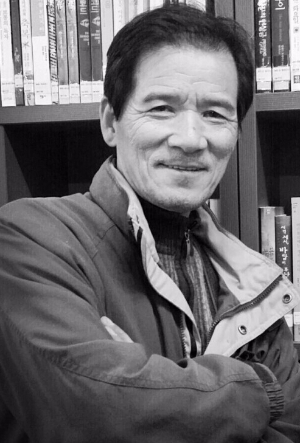





![[뉴욕증시] 中 보복관세 발표에 이틀째 폭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5040505241304089be84d876741182211201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