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불평등 인식이 강한 편이다.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상·하위 구간 간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154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6.5% 증가하는 사이 하위 20%의 소득은 5.4%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 격차도 5.69배로 1년 전보다 더 커졌다. 평균 가계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는 의미다.
자산 불평등은 소득보다 더 심하다. 상위 20%와 하위 20% 간 자산 격차는 2014년 93.2배에서 2022년 기준 140.2배로 커졌다는 게 서울연구원의 조사 결과다.
자산의 절대액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이 상위 계층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가격 상승에 따른 부(富)의 증가도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로 최하위 계층의 부동산 자산 규모는 2014년보다도 더 줄었을 정도다.
주택가격 상승은 지역별 불평등을 불러온 핵심 요인이다. 2014년 대비 2022년 전국 평균 순자산증가율은 65.9%다. 가격으로 따지면 1억8114만원 오른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77%(2억5070만원) 올라 49%(1억1242만원)에 그친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확대했다. 서울의 자산이 3억1877만원 늘어나는 사이 충남은 3452만원밖에 증가하지 않은 탓이다. 정부세종청사의 공무원조차 수도권 주택 보유를 선호하는 이유다.
금융 이용 기회의 불평등도 심각하다. 소득과 보유 자산이 많을수록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금리 조건도 유리하다 보니 자산 상위 계층일수록 담보대출 등을 활용하기 쉽다.
고금리인 신용대출에 의존하는 하위 계층보다 저비용 부채를 지렛대로 활용해 자산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다.
사회 불평등을 개선하려면 청년층을 위한 자산 형성 기회를 부여하는 등 치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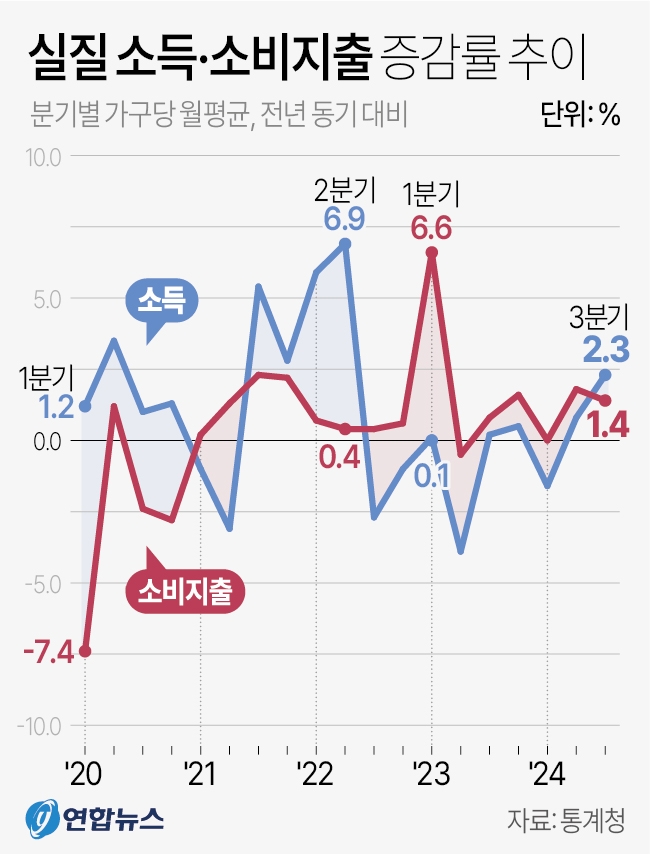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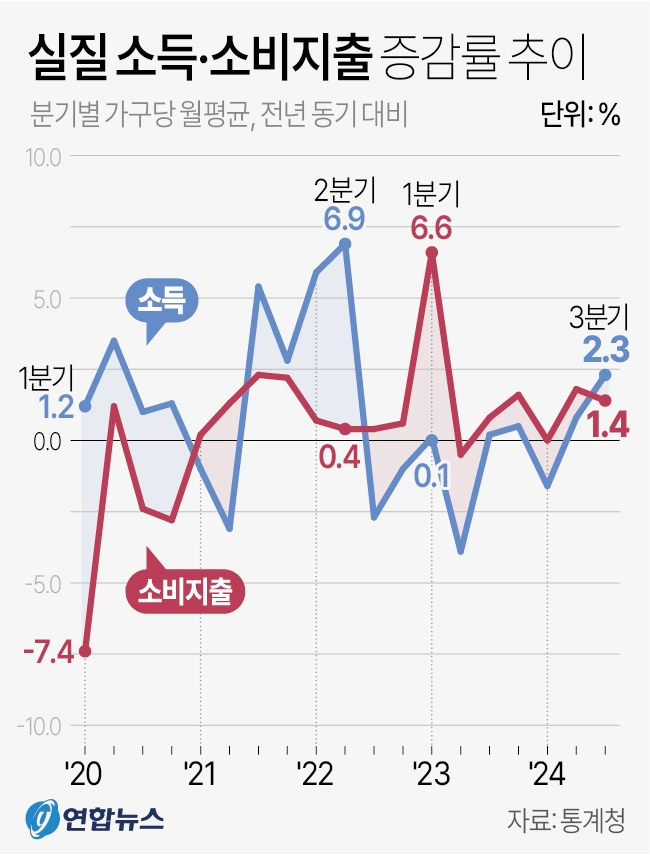










![[서울모빌리티쇼] 넥쏘·PV5·제네시스 컨버터블 콘셉트 등 눈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315445608370112616b072175213103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