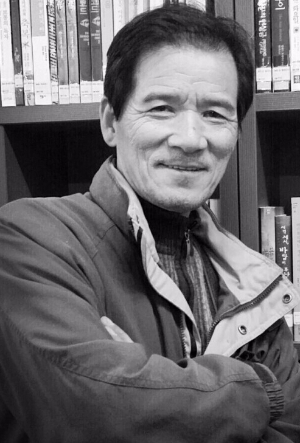용비교 아래 다리를 건너 응봉산을 왼쪽에 두고 중랑천을 거슬러 오르면 이내 살곶이다리에 이른다. 보물 제1738호로 지정된 살곶이다리는 현존하는 조선의 다리 중 가장 긴 다리로 억새와 갈대가 어울려 천변의 정취를 느끼기에 안성맞춤이다. 화살이 꽂힌 자리란 뜻의 ‘살곶이’란 지명엔 몇 가지 설이 전해온다. 태조 이성계가 응봉에서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을 맞은 새가 중랑벌에 떨어져 살곶이라 했다는 설과 함흥에서 돌아온 이성계가 이방원을 보고 노여움을 참지 못해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기둥에 꽂혀 살곶이라 했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 살곶이 부근에서 청계천이 중랑천과 만나 한 물결이 되어 한강으로 흘러간다.
서로 다른 물길이 합쳐지는 곳엔 먹이가 풍부해 많은 새들이 모여든다. 물까마귀로 불리기도 하는 민물가마우지와 청둥오리, 비오리, 중대백로, 쇠백로, 왜가리 등은 흔하게 볼 수 있다. 옅은 회색 날개를 지닌 해오라기와 갈색 깃털의 덤불해오라기를 볼 수 있었던 건 큰 행운이었다. 그 외에도 흔한 텃새인 직박구리와 유별나게 목이 굵고 등이 초콜릿색인 콩새, 뱁새라 불리는 붉은머리오목눈이도 덤불 사이를 부지런히 날아다닌다. 서울 한복판인 청계천에서 이렇게 많은 새를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물이 맑아졌기 때문이다. 천변을 따라 심어놓은 감나무엔 노을빛을 닮은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어 제법 정겹다.
청계천 중간에 있는 영도교에서 계단을 올라 천변을 벗어났다. 영도교는 단종의 왕비인 정순왕후가 단종과 마지막 이별을 한 곳으로 '영원히[永] 보냈다[渡]'고 후세에 지은 이름이다. 영도교 부근은 정순왕후의 시녀들이 채소 장사를 했다는 여인시장이 있었고, 북쪽으로 고개를 들면 정순왕후가 날마다 영월 쪽을 바라보며 단종을 그리워했다는 동망봉이 보인다. 그 여인시장이 지금은 벼룩시장으로 바뀌었다. 바로 옆에 중국 촉나라 장수 관우를 모신 동묘도 있다. 동묘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 진린의 청을 받아 세운 힘없는 나라의 아픔을 품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동묘를 돌아 흥인지문까지 걸어 식당에서 조촐한 송년회를 겸해 잔을 부딪치며 트레킹에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숲에서 시작해 한강과 중랑천, 청계천을 따라 걷는 길은 역사와 생태, 현재의 사람을 두루 돌아볼 수 있는 천변 산책길이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길목, 서울 천변을 거닐며 나를 되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왔던가. 또 얼마나 많은 다리를 건너왔던가.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내가 선택한 길에 후회는 없었는지, 다리를 건널 때마다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곰곰 생각해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사람이 팍팍할지라도 시간이 난다면 천변에 나가 잠시라도 갈대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볼 일이다. 천변에 앉아 하늘을 날아오고 날아가는 새들을 무연히 바라볼 일이다. 유장하게 흘러가는 강의 물결을 바라보노라면 메말랐던 삶에 물기가 돌고 지친 다리에 다시 걸어갈 힘이 생겨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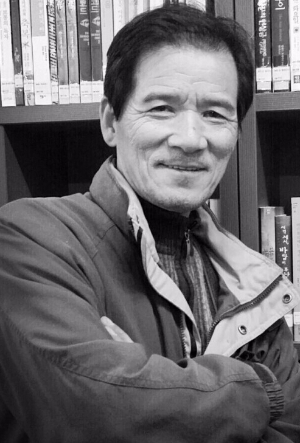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백승훈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