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으로 하나가 되는 여름 숲과 달리 겨울 숲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나무들은 함께이면서도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 휑한 산을 하얀 눈이 채워주고 있다. 둘레길을 걷다 보면 야생 멧돼지 출몰 지역이라는 경고 팻말이 간혹 눈에 띈다. 하지만 짐승들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는다. 눈을 밟으며 산길을 걷다 보면 생각이 가지런해질 때도 있지만 때론 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서로 엉키기도 한다. 이미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새록새록 돋을새김되기도 하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일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한다. 눈이 내리는 숲을 걸을 때는 ‘잠시’라는 공백이 필요하다고. 집을 나서기 전에 ‘잠시’ 창문으로 날씨를 확인해야 하고, 집으로 들어서기 전에는 ‘잠시’ 어깨에 앉은 눈을 털어내야 한다고. 겨울 숲의 서늘한 기운이 감성을 자극해 사유가 선명해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겨울 숲을 산책하고 돌아올 때면 생각이 점점 더 명료해진다.
겨울 숲을 거닐며 나뭇가지의 겨울눈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겨울눈은 새해에 잎, 꽃, 가지가 나오는 생명의 산실이며 그 소중함은 가을 열매에 못지않다. 나무마다 제각각의 모양으로 매달린 겨울눈은 지난 시절의 화려했던 꽃과 열매가 주는 느낌 이상의 색다른 감동을 준다. 겨울 동안 나무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추위와 건조다. 이를 견뎌내기 위해 나무들은 아주 치밀하고 정교한 겨울눈을 만들어 낸다. 참나무의 일종인 신갈나무 겨울눈은 50여 개의 작은 비늘로 둘러싸여 있다. 각 비늘의 끝부분은 하얀 털이 밀생하여 찬 바람과 추위가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다. 습기의 출입도 철저히 통제됨은 물론이다.
미래의 생명을 위한 준비는 이토록 단호하며 철저하다. 겨울눈을 살펴보다 보면 그 지극함에 절로 감탄하게 되고, 치밀하고 정교한 설계에는 엄숙함마저 느끼게 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아름드리나무도 털끝 같은 씨앗에서 나오고, 높은 누대도 한 무더기 흙을 쌓는 데에서 시작되고, 천 리 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추상적인 노자의 철학에서 드물게 이해하기 쉽고 바로 공감할 수 있는 구절이다. 겨울 숲에서 노박덩굴의 붉은 열매를 보거나 솜처럼 피어나 바람을 타는 하늘타리 씨앗들을 볼 때면 나는 곧잘 이 노자의 말을 떠올리곤 한다. 겨울 숲은 적막할 정도로 조용하고 수직의 나무들은 선 채로 죽은 듯 보이지만 그 숲의 고요는 죽음의 침묵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간으로 건너가기 위한 침묵의 시간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새해가 차고 정한 겨울에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시작이 작고 부족할지라도 노력을 끊임없이 쌓아가다 보면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도 있는 게 세상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도중에 지쳐서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자연은 그저 존재할 뿐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숲에서 느끼고 깨닫는 것은 오롯이 사람의 몫이다. 무심히 지나치면 한낱 풍경에 불과하지만, 눈과 마음을 모으면 숲은 새로운 느낌과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자연은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즐기고 느끼는 자의 몫이요, 길은 만든 자의 것이 아니라 걷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료할 때면 겨울 숲을 천천히 거닐어 볼 일이다. 옷깃을 파고드는 북풍이 성가실지라도 약간의 귀찮음만 이겨내면 새로운 풍경 속에 자신을 끼워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오감을 열고 숲에 들어서면 청정한 자연이 들려주는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겨울을 건너가는 몸이 자주 삐걱거린다. 나이 들수록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운동하면 운동을 한 부분이 아프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한 곳이 욱신거린다. 누군가 독감백신을 맞고도 독감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언을 들은 것도 최근 일이다. 찬 바람에 쫓겨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요즘, 나는 종종 눈 내린 겨울 숲을 떠올리곤 한다. 길을 걷다가 눈을 뒤집어쓰고 있는 맥문동이나 수호초를 볼 때면 가슴이 짠하기도 하고, 잎을 펼친 채 혹독한 겨울을 지내는 당돌한 풀들을 만나면 그 집념과 용기에 숙연해지기도 한다. 알몸으로 겨울을 견디는 나무에 비하면 인간의 겨울은 그리 혹독하지는 않다. 우리 삶에 여유와 쉼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숲을 찾아 겨울나무의 말에 귀 기울여 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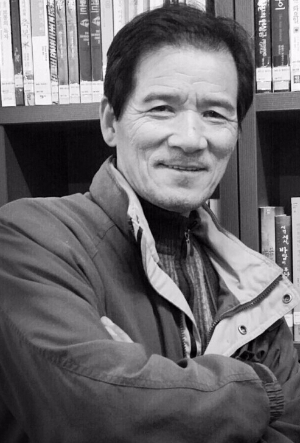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백승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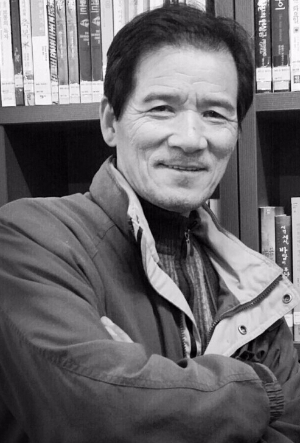


![[뉴욕증시] 트럼프 취임 앞두고 3대 지수 반등](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5010115010100468e250e8e188106252249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