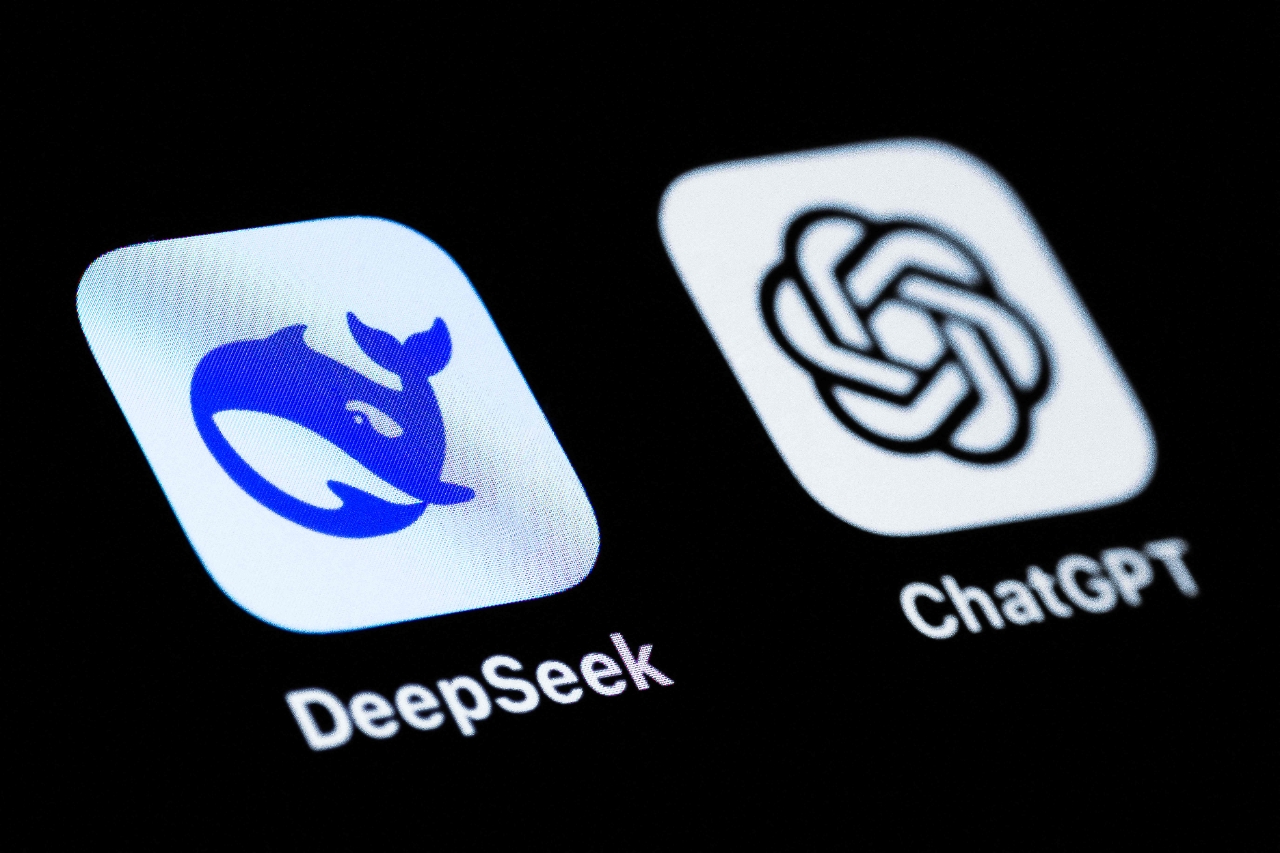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다음 단계인 GPT-5를 출시하지 못한 채 다중 모드 이해나 강화학습 대안 찾기에만 부심하고 있다. 알고리즘과 연산능력 면에서 보면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 셈이다.
이 틈새를 노린 것이 중국 AI 스타트업들이다. 딥시크는 중국에서 내로라하는 스타트업에도 못 들던 업체다.
중국 AI 업계는 알고리즘 경쟁 중이다. 알고리즘 경쟁력을 확보하면 적은 연산능력으로 더 큰 강화학습 모델을 훈련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둔 딥시크가 558만 달러의 비용으로 챗GPT의 성능을 추월한 AI 모델을 개발한 이유다.
미국의 첨단 칩 수출제한 조치로 중국 스타트업은 GPU나 특수 칩 등 수천 개의 하드웨어 유닛에 의존해 AI 모델을 구동하고 있다. 10만 개의 유닛으로 구성된 컴퓨팅 클러스터를 갖춘 오픈AI와 대조적이다.
부족한 연산능력과 자금이 오히려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최적화를 앞당긴 요인이다.
딥시크 충격은 한마디로 한국이 기술력 면에서 중국에 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없이도 기술을 구현하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 결과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생성형 AI 특허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출원된 생성형 AI 관련 특허 5만4000건 중 76%가 중국 몫이다. 한국은 중국의 9분의 1 수준이다.
전문 인재 양성과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지 않고서는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