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갈 곳 없는 땅끝에 서서/ 돌아갈 수 없는 막바지/ 새 되어서 날거나/ 고기 되어서 숨거나….” 인용한 글은 김지하의 시집 ‘애린’에 들어 있는 ‘땅끝에 서서’란 시의 일부다. 땅끝을 생각할 때면 부록처럼 떠오르는 시이기도 한데 이젠 자연 속을 거닐며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할 순례길이 생겼으니 땅끝이라서 더는 갈 곳이 없다고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달마고도는 달마산을 한 바퀴 도는 옛길이다. 높이 있는 길(高道)이기도 하지만 옛길(古道)이 더 맞는 표현이다. 달마고도는 미황사 찻집 아래 왼쪽에서 시작한다. 큰바람재를 넘어 노지랑골, 도솔봉 아래 있는 물고리재를 거쳐 달마산을 한 바퀴 돌아 원점 회귀하는 길이다.
아름다운 절 미황사를 둘러보고 트레킹을 시작했다. 미황사 대웅보전이 보수 중이라 달마산 암봉을 배경으로 한 고색창연한 모습을 볼 수 없음을 아쉬워하며 산길로 들어서니 구실잣밤나무와 사스레피나무, 편백나무, 조릿대가 있는 상록수림이 계절을 잊게 한다. 이따금 너덜겅 지대가 나타나지만 길이 잘 다듬어져 있어 걷는 데엔 불편함이 없다. 큰바람재를 지나면 산길은 방향을 틀어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며 크고 작은 섬들이 물 위에 떠 있다. 관음암 터에 있는 작은 못에서 개구리와 도롱뇽 알을 보았다. 경칩이 멀지 않으니 이들도 봄맞이 준비를 하는 모양이다.
달마산은 중국 사람들도 인정하는 달마대사의 이름에서 빌려온, 대사의 법신(法身)이 머무르고 있다는 명산이다. 먼 옛날 구도의 길을 찾아 나선 스님을 떠올리며 산길을 걷는다. 마음을 가다듬어 번뇌를 끊기 위한 선정(禪定) 도중에 잠들어버린 것에 화가 나서 자신의 눈꺼풀을 잘라 내버렸다는 달마대사. 그 눈꺼풀이 땅에 떨어져 차나무가 되었고, 그래서 녹차를 마시면 잠이 물러간다는 전설의 주인공이다.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난다. 산 자와 죽은 자가 바로 그들이다. 살아있는 사람과는 말을 섞고, 죽은 사람과는 생각을 섞는다.
관음암 터를 지나면 너덜지대가 몇 번 더 나타난다. 억겁의 세월 속에 바위가 얼었다 녹기를 되풀이하며 비바람에 깎여 쌓였을 것이다. 이 길에는 개서어나무와 사스레피나무가 대세를 이루고, 상록성 덩굴식물인 마삭줄과 송악도 이따금 눈에 띈다. 물고리재에서 미황사에 이르는 길엔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붉가시나무·비목나무·사람주나무가 보이고, 사람들이 가꾼 삼나무·튤립나무·편백나무도 있다. 미황사 부도전을 마지막으로 장장 7시간여의 기나긴 달마고도를 완주했다.
달마고도 트레킹을 하기 전날, 저녁 무렵 도솔암에 올라 낙조를 보았다. 도솔암은 달마산 절벽 끝에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 기도 도량이다. 미륵불이 내려온다는 도솔암에 오르면 일출과 일몰을 다 볼 수 있지만, 특히 서해로 떨어지는 낙조의 장엄하고도 화려한 까치놀은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비경(祕境) 중의 비경이다. 달마고도를 찾는 분이라면 필히 도솔암 낙조를 놓치지 마시길 강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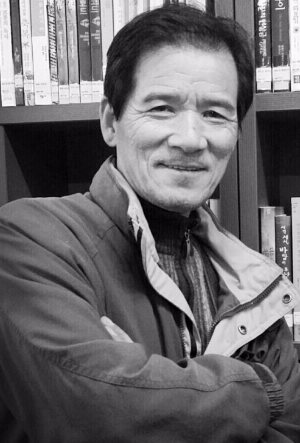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백승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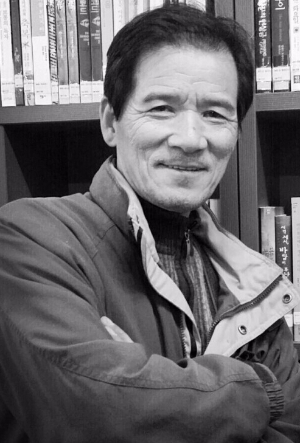


![[뉴욕증시] 관세폭탄에 시간외 '패닉 매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5040306393300386e250e8e18858229110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