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만 해도 어딘가엔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기온이 급강하해 칼바람이 불어대더니 한 이틀 사이 햇살의 온기가 따사롭기 그지없다. 꽃이라도 피어 있다면 봄의 한가운데에 나앉은 줄 착각할 지경이다. 맵차던 바람이 부드럽게 몸에 와 감기고 바람이 스친 꽃나무 가지마다 꽃망울이 툭툭 불거지는 것만 같다. 조용히 웅크리고 있던 나무들이 몸을 쭉 펴고 일제히 기지개를 켜는 것 같다. 겨우내 털코트로 꽁꽁 싸매고 있던 백목련의 꽃망울도 한결 윤기가 돌고 수양버들 실가지에도 연둣빛이 감돈다. 사나운 북풍에도 붉은 열매를 달고 있던 산수유나무 가지에도 꽃망울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벚나무들도 무슨 음모를 꾸미는지 한껏 수상해졌다.
계절의 경계는 늘 모호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요즈음이 특히 그렇다. 개인적으로 봄은 기다리기보다는 찾아 나서는 거라고 생각한다. 봄의 시작은 땅을 보면 알 수 있다. 마파람이 불기 시작하면 땅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땅속으로부터 비집고 올라오는 조그마한 '초록'들 때문이다. 추운 겨울을 숨죽여 지내면서 세상 밖으로 빠끔히 얼굴 내밀어볼 날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 초록의 새싹이 반가운 것은 그들이 봄을 알리는 전령이어서가 아니다. 갖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 작은 몸짓으로 피워내는 당찬 생명력이 눈부시기 때문이다. 이른 봄 언 땅을 비집고 올라온 새싹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가슴이 설레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천변으로 나가 봄의 기미를 살핀다. 볕이 잘 드는 둑에선 하늘색 개불알풀꽃이나 광대나물꽃이 눈에 띄기도 한다. 꽃이 아니라도 냉이나 꽃다지, 민들레 같은 로제트 식물들도 햇볕을 쬐며 봄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소통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일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준다. 아직은 꽃샘바람이 매운 봄의 들머리이지만 눈을 씻고 찾아보면 봄의 기미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어린 새싹들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 마른 풀 사이에서 새싹을 밀어 올리는 것들, 그 여린 초록의 생명을 불러낸 것은 햇볕이었을까? 바람이었을까?
봄은 기다려도 오고 기다리지 않아도 온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보다 찾아 나서는 이에게 더 빠르게, 더 풍성하고 찬란한 봄을 선물처럼 안겨준다. 작은 화분 몇 개 집 안에 들여놓는 일은 꽃의 아름다움을 탐하는 욕심이라기보단 봄을 일찍 맞이하고픈 간절함의 몸짓에 더 가깝다. 햇살의 온기가 빠르게 올라가며 봄이 잰걸음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서고 있다.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봄을 맞이해야겠다. 겨우내 잔뜩 웅크렸던 몸도 활짝 젖혀 기지개를 켜고 봄 들판으로 나아갈 채비를 해야겠다. 분명 새로 오는 봄은 지금껏 보아왔던 봄보다 눈부실 것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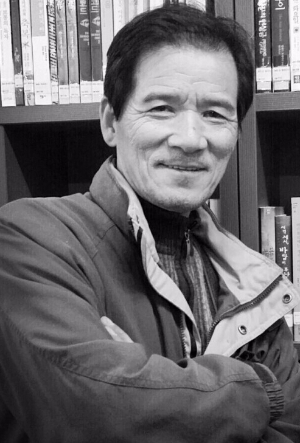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백승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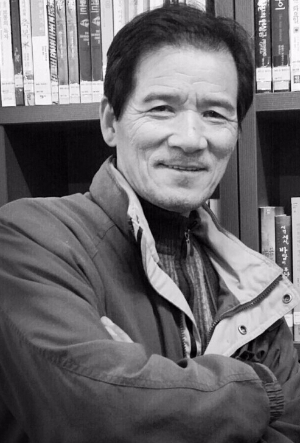


![[뉴욕증시] 관세폭탄에 시간외 '패닉 매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5040306393300386e250e8e18858229110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