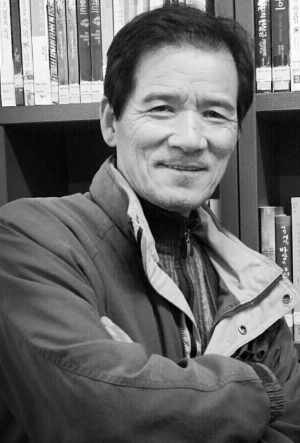복잡한 시내를 벗어나 조금만 산속으로 몸을 숨겨도 전혀 딴 세상 같다. 비록 정상에서 일출은 놓쳤어도 채 어둠이 물러가기 전이라 서쪽 산 능선 위로 떠 있는 반달을 벗하며 걷는 산길은 내 거친 숨소리 외엔 적요하기 그지없다. 아직은 맵찬 바람이 가끔 콧물을 훔치게 하지만 골짜기의 얼음이 풀려 흐르는 계곡물 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지길 되풀이한다. 도선사 주차장을 지나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한다. 어느새 새벽빛이 닿아 어둠을 걷어내는지 흐릿하던 등산로의 돌계단과 주변 풍경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산을 오르다 지난번 산행 때 만났던 오색딱따구리 생각이 나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고요하기만 하다.
하루재를 넘어 백운대 오르는 길로 접어들자 응달진 곳엔 잔설이 희끗희끗하고 등산로에도 얼음이 남아있다. 등산객들의 발길에 바스러진 가랑잎들이 얼음을 덮고 있어도 자칫 잘못 디뎠다간 미끄러지기 쉽다. 백운산장을 지날 무렵 아침 해가 솟아올랐다. 아침 햇살을 받은 인수봉의 홍조 띤 모습이 마치 수줍은 새색시 같다. 산에 오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감상이다.
아직은 어디에도 꽃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멋진 일출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서두르지 않고 쉬엄쉬엄 정상에 올랐다. 아직은 산에 오르는 일이 힘겹게 느껴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가.
지난주엔 팔당 세정사 계곡으로 바람꽃을 보러 갔었다. 올해는 꽃이 늦어 겨우 너도바람꽃 몇 송이를 보았을 뿐이었다. 일반적으로 식물들이 꽃을 피울 때를 알게 되는 것은 일장(日長), 즉 낮의 길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하는 다양한 요인이 꽃 피는 시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기온이 올라가면 식물의 생장에 유리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정 기간 낮은 기온에 있어야 그 자극으로 꽃을 피우거나 씨앗의 싹틔우기가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그런 이유로 야생화의 개화 시기를 정확히 알아맞히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산이나 들에서 꽃을 만나는 것이 행운이라 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의 숲은 봄맞이로 분주하다. 정중동(靜中動) 속에 우리를 놀라게 할 꽃 폭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산길에 참나무 사이로 샛노란 꽃을 피워낸 생강나무가 지친 나를 반겨주었다. 아파트 화단에서 산수유를 볼 수 있다면 산에서는 생강나무가 있다. 생강나무(영어명: Korean spicebush)는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에서 개나리·진달래보다도 먼저 꽃을 피워 우리에게 봄을 알려주는 봄의 전령이다. 대부분의 봄꽃이 그러하듯이 생강나무도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피는 ‘선화후엽’으로 알싸한 향기를 풀어놓으며 산중에 봄이 왔음을 알려준다.
이제 생강나무꽃이 피었으니 봄이 왔다고 소리쳐도 탓하는 이 없을 것이다. 물든 단풍 한 잎이 가을을 알리듯 노란 생강나무꽃이 핀 것만으로 천지간에 봄빛은 이미 충만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생동하는 봄이다. 김광석의 노래처럼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오감을 활짝 열고 봄을 마중할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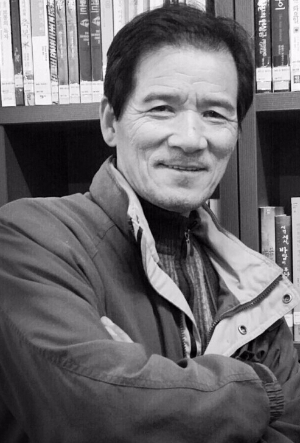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백승훈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