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짝 핀 백목련이 하나둘씩 꽃잎을 내려놓으며 봄은 깊어져 가는데 연둣빛 안개가 짙어지는 수양버들을 보면 정녕 봄을 깊게 만드는 건 초록이라는 걸 실감하게 한다. 그러고 보니 봄 숲을 점점홍으로 수를 놓고 있는 연분홍 진달래보다 화살나무나 회양목, 모과나무, 버드나무, 참나무의 새순들이 풀어놓는 연록의 색깔들이 잠든 숲을 깨우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 같다.
숲 들머리에서 흐드러지게 핀 노랑 개나리와 아가의 살빛을 닮은 살구꽃의 물결에 취했다가 시선을 거두고 숲으로 들어선다. 어제 내린 비로 숲길은 젖어 있다. 젖은 숲에 불 밝히듯 점점홍으로 피어 있는 분홍 진달래가 반갑기 그지없다. 그새 제법 자란 연초록의 원추리와 이름 모를 새싹들이 갈색의 숲을 깨우고 있다.
겨우내 얼어 있던 작은 계곡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반갑다. 국수나무 덤불 사이로 붉은머리오목눈이와 박새가 부지런히 모습을 드러냈다 사라지길 반복한다. 그 경쾌한 움직임이 사랑스럽다. 볕바른 언덕에 올벚나무 한 그루가 가지 가득 꽃을 피워 달고 숲을 환하게 밝히고 서 있다. 문득 여기까지 오도록 누구에게 작은 빛 하나 건넨 적 없는 내 삶이 부끄러워졌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고 했던가. 무탈하게 여기까지 왔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자신을 위로하며 걸음을 옮긴다. 날이 따뜻해지고 꽃이 피기 시작하니 등산로에도 제법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인적이 뜸해도, 사람들 발길이 잦아져도 숲은 계절을 잊지 않고 묵묵히 제 일을 할 뿐 게으름을 피우는 법이 없다.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녹비홍수(綠肥紅瘦)’란 사자성어가 있다. 풀이를 하자면 초록은 살찌고 꽃의 붉은 기운은 야윈다는 뜻이다. 화르르 불타듯 피어난 꽃들이 지기 시작하면서 초록으로 물들어 가는 봄 숲의 풍경을 표현한 말로 이보다 근사한 말은 없지 싶다. 햇살의 간질임에 고개를 막 내민 새싹에 닿은 빗방울들이 풀잎들을 쉬지 않게 자라게 하고, 빗방울이 스친 자리마다 이 세상 맺힌 것들이 다 풀어지고, 이 세상 메마른 것들이 모두 젖어서 보이지 않던 것들까지 환하게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있음이 진정 축복이란 걸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비가 내리면 꽃이 질까 두려워했던 나의 마음이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비에 젖은 숲길을 걷다 보면 절로 깨닫게 된다.
이미 지나가 버려 되돌릴 수 없는 어제와 아직 오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내일 때문에 후회하거나 미리 헛심을 쓰지는 말 일이다. 그보다는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풍경을 즐기고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봄비 한 번 스칠 때마다 봄은 십 리씩 깊어진다는 말이 있다.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 만화방창(萬化方暢)한 이 화창한 봄날에 봄꽃처럼 웃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다.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이내 지나가 버릴 봄, 인생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지나간 뒤에 후회하지 말고 부디 이 순간, 이 봄날을 맘껏 즐기시라 강권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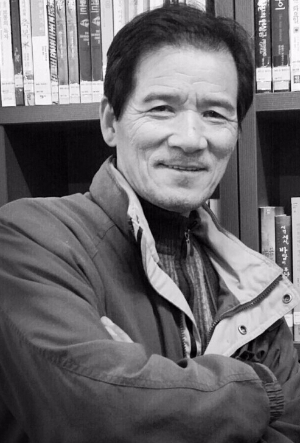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백승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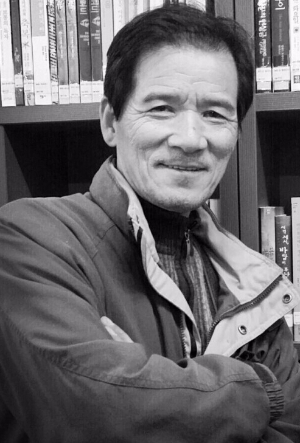









![[초점] 中 ‘對美 보복 관세’ 후폭풍…미국 자산 흔들리고 금값...](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12140222047379a1f3094311109215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