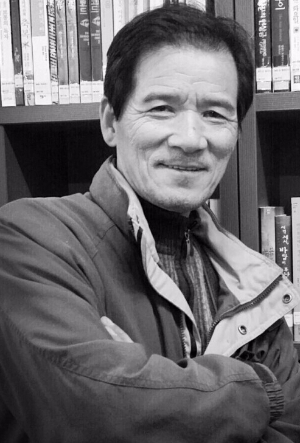나무 계단을 내려와 사과나무 과수원 사잇길을 걷는데 순백의 꽃을 가득 피워 단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나를 반겨준다. 야광나무다. 야광나무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장미과 사과나무 속의 낙엽 활엽 교목인데, 새하얀 꽃송이가 마치 불을 켠 듯 밤에도 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산을 오르다 보니 군데군데 피어 숲을 수놓고 있는 산철쭉은 이제 거의 끝물이고, 팥배나무꽃·병꽃나무꽃이 한창이다. 능선을 타고 올라 쌍둥이 전망대에 오르니 사방이 온통 초록 물결이다. 북한산의 인수봉과 백운대, 만경봉 그리고 도봉산의 화강암 암봉들이 초록의 바다 위에 우뚝 솟아있는 모습은 말 그대로 장관이다.
연두에서 초록으로 짙어가는 숲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초록이 내 몸마저 물들일 것 같은 생각마저 든다. 흔히 초록을 ‘자연의 색’이라고 한다. 하지만 초록은 단순한 배경의 색이 아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색이지만 초록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너그러운 색이자 가장 깊이 있는 색이기도 하다. 우리는 산과 들을 마주하며 초록이 주는 평온함을 느끼고, 새싹이 움트는 모습을 보며 생명의 순환과 회복을 깨닫는다. 태초부터 존재했던 이 색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생명의 변화와 성장을 상징한다. 초록은 정지된 색이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 숨 쉬는 색이기 때문이다.
초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온다. 이제 막 돋아나 새로운 시작이라 속삭이는 연둣빛 새순과 이미 초록으로 짙어져 생명력의 절정을 보여주는 숲을 바라보면 삶에 대한 열정이 솟아난다. 심리적으로 초록은 치유와 회복의 색이다. 푸른 숲속에서 숨을 고르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초록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평온을 되찾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속삭인다. 어린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듯 편안함 속에서도 변화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가지라고 끊임없이 속삭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늘 다니던 길을 버리고 무수골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냇가에 앉아 맑은 물에 세수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냇가에 앉아 손을 씻으며 건너편 바위틈에 핀 철쭉을 바라보다가 문득 공자가 말한 '70살이 되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도 세상의 법도를 넘지 않는다'는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를 떠올렸다. 어느 길을 택해도 집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어느덧 공자가 말한 칠십이 가까우니 가끔은 새로운 길을 택해도 불안하거나 초조할 까닭은 없다. 나이가 들어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낯선 길을 걸어야 새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으니 그 또한 나쁘지 않다.
사랑을 한 가지 색으로 정의할 수 없듯이 초록도 부드럽고 차분한 연한 초록부터 깊이 있는 짙은 초록까지, 다양한 톤이 어우러져 하나의 의미로 고정할 수는 없다. 시시각각 변하는 숲의 초록이지만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그 순간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언제든 그 푸른 숲을 다시 걸을 수 있다고. 초록은 우리에게 속삭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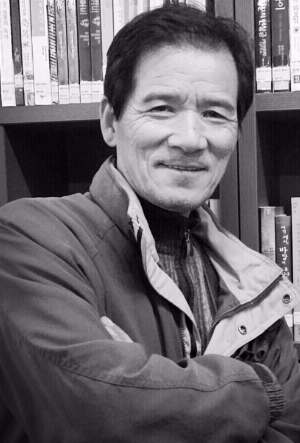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백승훈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