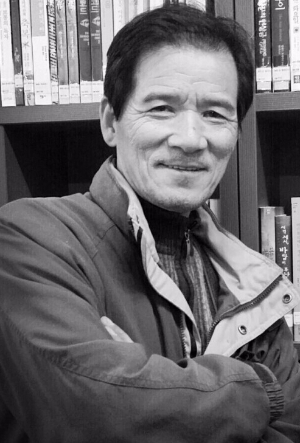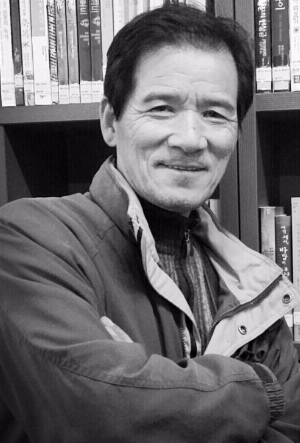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청량리역에서 KTX에 오를 때만 해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는데 진부역에 내렸을 땐 잔뜩 흐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택시를 타고 국사 성황당 입구에 도착했을 땐 빗방울이 제법 굵어졌고 비안개에 가려 먼 산의 윤곽도 흐릿해졌다. 비옷을 챙겨 입고 산을 오르는데 먹이를 찾아 나온 두꺼비가 등산로에 얼쩡거린다. 뚝갈과 흰진범, 주황색 동자꽃과 황금색 마타리가 자주 눈에 띈다. 마타리는 여름과 가을이 갈마드는 시기에 피는 꽃이다. 연보라색 개미취와 곤드레로 부르는 고려엉겅퀴도 곱게 피어 어김없이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사방이 안개에 점령당한 선자령에 올랐다. 허공에서 풍차 돌아가는 소리는 들리는데 안개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사방이 안개에 에워싸인 선자령의 풍경은 오래전 읽었던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을 떠올리게 했다. 김승옥 작가의 감수성 예민하던 스무 살 젊은 시절, 그 절정에 달한 언어의 촉수로 유리 조각처럼 서슬 퍼렇게 써 내려간 소설의 문장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한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뺑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안개, 무진의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안개는 모든 것을 지워버리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품에 안기도 한다. 계곡이 아름다워 선녀가 아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목욕하고 갔다고 해서 선자령(仙子嶺)이라는데 안개가 모든 것을 삼켜버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투명한 가을 햇살과 바람에 휘날리는 억새, 끝도 없이 이어진 대관령 목장의 유려한 능선을 따라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이국적인 풍광을 만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서둘러 하산을 했다.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은 산 자만의 특권이기도 하니까. 비에 젖고 선자령의 바람을 맞은 탓인지 여름내 무더위에 지친 몸이 덜덜 떨려왔다. 이 여름에 느끼는 한기라니. 식당에서 젖은 옷을 말리며 뜨끈한 두부전골을 시켜 늦은 점심을 먹었다. 비와 안개 때문에 걸음을 재촉한 덕분에 이른 귀갓길에 올랐지만 돌아와 사진첩을 뒤적이며 다녀온 길을 되짚어 보려니 아직도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만 같다.
백승훈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