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요일에 만나는 詩와 그림
밤중엔 역시 대숲에서 부는 바람이 단연 최고다. 멀리 갈 것 없다. 가까이에 그림을 눈 앞에 두자.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주는 시원함이 아니라 가슴에 일렁이는 청량함이 생겨날 것이다. 어쩌면 그림이 무더위에서 ‘나’를 지켜낼 것이다
손수레인 나를 / 문태준밤중엔 역시 대숲에서 부는 바람이 단연 최고다. 멀리 갈 것 없다. 가까이에 그림을 눈 앞에 두자.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주는 시원함이 아니라 가슴에 일렁이는 청량함이 생겨날 것이다. 어쩌면 그림이 무더위에서 ‘나’를 지켜낼 것이다
외발의 손수레가 있다
늙은 아버지가 포도밭 사이로 거름을 낼 때 쓴다
손수레는 하루쯤 일없이 있다
오늘이 그날이다
손수레를 오늘은 일 없는 내가
끌고 가보았다
손수레는 배와 물고기와 한가지로 흘러가는 것
대밭으로 굴속으로 다리 위를
굴리고 굴리고 갈 뿐
아득히 먼 곳까지는 아니었다
어두워졌을 때 그만두었다
싣고 돌아온 것조차 없었다
손수레를 있던 자리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누가 이 손수레를 끌고 다녔는지 알 수 없었다
손수레인 나를 일없이 끌고 다닌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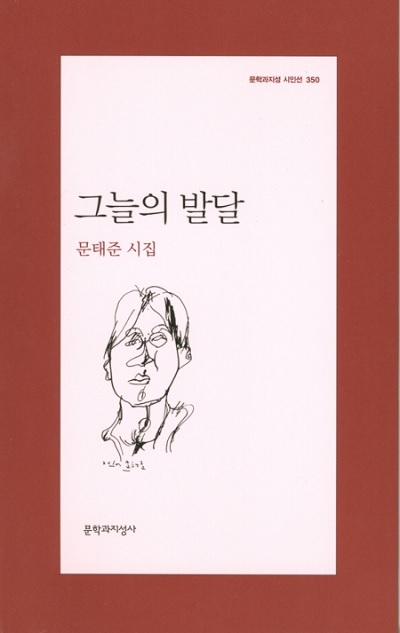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죽어가던 연애 세포를 일깨우는 네 글자(四字)와 밤이면 밤마다 마주치는 일은 아주 설렌다. 내겐 오락이니 즐겁다!
잠자기 전 약 30여 분 독서를 날마다 습관스레 한다. 요사이 <송사삼백수(宋詞三百首)>를 보는 재미에 빠졌다. ‘섬세하고 교묘한 필치로 대상물을 잘 묘사’하는 중국 남송(南宋)시대 문인 사달조(史達祖)의 ‘삼주미(三妵媚)’를 반복하여 읊조리다가 아마도 잠들었을 것이다.
이튿날 한낮에 다시 보았다. 책의 여백에다 연필로 쓴 네 글자 메모는 이랬다. ‘枕肩歌罷(침견가파)’와 ‘歸來暗寫(귀래암사)’가 그것이다. 노래(시 낭송)가 끝나자 내 어깨에 기대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몰래 필사한다는 뭐, 그런 뜻이다.
문태준 시인(1970~ )의 <손수레인 나를>이라는 제목을 단 시를 처음 보았을 때, 그 느낌이 딱 그랬다. 시적 풍경이 함축적이다. 뒷맛이 자연스럽다. 느릿하게 읽힌다. 그래서 난, 시에게 어깨를 내어주었고, 집에 오면 또 그 시를 가만히 베꼈다.
외발의 손수레가 있다
늙은 아버지가 포도밭 사이로 거름을 낼 때 쓴다
손수레는 하루쯤 일없이 있다
오늘이 그날이다
농사하는 집에는 한두 대 ‘외발 손수레’가 꼭 있다. 외발은 일륜(一輪)으로 바퀴가 하나짜리를 가리킨다. 밭 도랑 사이의 매우 좁은 길을 요리조리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기구이다. 예컨대, 손수레는 시와 같이 “늙은 아버지가 포도밭 사이로 거름을 낼 때”마다 주로 쓴다. 그런데 시의 화자(話者)는 아버지가 있는 시골집에 모처럼 내려온 것 같다.
그 날은 때마침 비가 아침부터 왔을 것이다. 하여 “손수레는 하루쯤 일없이 있다/ 오늘이 그 날이다”라고 친절히 단 것이다.
농사꾼과 독서인에겐 이른바 ‘삼여(三餘)’가 있다. 세 가지의 여유 시간이 있긴 하다. 하루의 ‘밤’이 오는 시간이 첫째이고, 계절로는 ‘겨울’이 둘째에 해당되며, 여름철 무시로 찾아드는 ‘흐리고 비오는 날’이 그 셋째에 속한다.
수묵화가 우리 주위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먹으로 그린 흑백의 수묵화는 총천연색 영화에 밀린 흑백 무성영화나 같은 신세가 돼버렸다. 과연 수묵화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 그림인가. (중략) 물고기 세 마리를 그려놓은 수묵화는 ‘삼여도(三餘圖)’라 했다. 어(魚)와 여(餘)가 중국어 발음이 같기 때문에 삼어(三魚)라 하지 않고 삼여(三餘)란 한 것이다. (손철주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 효형출판, 1998)
손수레를 오늘은 일 없는 내가
끌고 가보았다
손수레는 배와 물고기와 한가지로 흘러가는 것
대밭으로 굴속으로 다리 위를
굴리고 굴리고 갈 뿐
아득히 먼 곳까지는 아니었다
어두워졌을 때 그만두었다
싣고 돌아온 것조차 없었다
손수레를 있던 자리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아버지의 물건인 ‘외발의 손수레’가 여가 중이었다. 하지만 아들(도시에 사는 직장인)은 “손수레를 오늘은 일 없는 내가/ 끌고 가보”기로 작정한다. 여기서 자칫 일기로 끝날 글이 시로 변주되는 지점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 단지 한 줄의 글이다. 그런데 이게 있어서 글은 더 이상 일기(日記)가 아니고 시(詩)적 풍경을 얻게 된다.
요컨대 “손수레는 배와 물고기와 한가지로 흘러가는 것”이라는 부분이 그렇다. 말이 안 되는 글인데, 묘하게 울림이 있는 까닭은 손수레를 배와 물고기와 같은 선상에다 놓고 나열함에 있다.
순식간에 ‘손수레’는 ‘배와 물고기’와 같은 존재의 이유로 “대밭으로 굴속으로 다리 위”로 “굴리고 굴리고 갈 뿐”인데 어쩐지 노동자(고용인)의 모습과 닮아 있다. 여느 도시 근로자가 그런 것처럼 시적 화자는 “아득히 먼 곳까지”로 나아가려(출근) 들진 않는다. 또 밤이 찾아오면 으레 그렇듯이 “어두워졌을 때 그만”하는 식으로 일과를 마치고자 할 뿐이다.
이런 행위는 날마다 반복이다. 연속의 시간이 된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수확이 없다는 잦은 허탈감에 빠지기 십상이다. 때문에 “싣고 돌아온 것조차 없”어 보이는 것이고 허전한 하루로 기억되는 것이다.
그런 일상을 날마다 또 살았다는, 자조적인 도시인의 푸념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수레를 있던 자리에 가만히 내려놓았다”에 습관적으로 닿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달리 아들의 “손수레는 배와 물고기와 한가지로 흘러가는 것”이 되어 버린다.
마지막이자 다음의 시행(詩行)은 놀랍다. 자칫 일기(日記)로 끝나는 글을 시적 긴장감으로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다.
“손수레인 나를 일없이 끌고 다닌 이를”
이 한 줄이 그렇다. 시처럼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질문할 줄 알아야 한다. 중간 중간, 내 삶에 있어서 숨을 한 번 크게 쉬려면 말이다. 말하자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고들 그러지 않던가. 하니 어쩌랴. ‘빨리’만 내달리기 보다는 ‘좀 느리게’도 뛰는 경주가 어쩌다 언덕이나 내리막길인 고비를 만나는 지점에선 꼭 필요하다.
손수레가 되고(고용인) 안 되고(피고용인)는 ‘갑을 관계’이다. 설사 ‘갑’이 되어본들 손수레인 나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 누군가는 또 다른 입장에선 ‘을’의 앞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뒷모습은 ‘갑’질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고 되레 ‘을’의 처지로 내비쳐질 수 있다.
대밭(竹林).
어떤 이는 ‘대숲’이라고 말한다. 도시 태생이 그렇다. 또 어떤 이는 ‘대밭’이란다. 시골 출신이 그리 말한다. 같은 사물을 놓고 바라보고 해석하는 프레임이 서로 다른 것이다.
‘밭’은 농작물의 터전이자 노동의 현장이 된다. 이에 반해 ‘숲’은 비생산의 놀이터이자 노동을 요구하지 않는 자연의 그늘이 된다.
다시 말해, 대밭은 가까이 사는 거주자에겐 ‘생활’로 곡식 같은 말로 번지고, 대숲은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나그네에겐 ‘삶’으로 꽃 같은 말로 가슴께에 스민다.
농작물로 보자면 일용할 양식인 대밭이지만 조경수로 보자면 대숲이 된다. 이것이 농촌인과 도시인의 경계를 가른다. 차이의 관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손수레인 나”란 화자는 농촌 사람에 더 가깝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인이 아주 된 것도 아니다. 포지셔닝이 어중간하다. 불안정하다. 퍽, 어정쩡한 것이다.
경자(庚子, 2020년), 한 해가 어느새 절반이나 흘러갔다. 칠월이 되었다. 노지(露地) 포도밭의 포도가 푸름(靑)이 지겨워져 몸을 붉은 빛(赤)으로 둥글게 말면서 물드는 때이다. 바야흐로 장마와 여름이 함께 시작한다.
앞에 소개한 시는 문태준 시집<그늘의 발달>(문학과지성사, 2008년)에 보인다. 시집은 처음, 포도가 익어가는 칠월에 서점가에 나왔더랬다. 따져보니 시인의 나이가 39세 때였다. 이맘 때가 인생의 나이로는 단맛이 포도처럼 잘 익어갈 무렵일 것이다. 그래서 나이로 마흔이 성공이라면 불혹(不惑)이고, 실패한다면 부록(附錄) 인생으로 남는다. 무릇 생(生)을 건너게 만든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해마다 꼬박꼬박 잘도 찾아드는 한여름의 무더위. 나는 망설인다. 에어컨을 살까, 아니면 그림을 걸어둘까 하고 갈팡질팡 한다. 그렇게 세 번의 여름이 지났다. 네 번째 한여름이 이제 코 앞에 다가왔다.
17세기 조선의 왕족 출신 이정(李霆, 1554~1626)의 <풍죽도(風竹圖)> 복사본을 구할 수만 있다면 거실 벽에 걸어두고 싶었다. 그림만 보더라도 아침 댓바람부터 금세 시원해질 것만 같다.
이도 아니면, 강요배 화가(1952~ )의 <마파람1> 복사본 그림을 사서 거실에 걸어두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라고 생각한다. 그런 적이 여러 번이었다. 시원한 남풍(南風)이 옥수수 밭을 지나치면서 곧장 내 방에 파고들 것만 같은 착각이 일어나는 그림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정의 고조 할아버지는 세종대왕이고, 증조 할아버지는 수양대군(세조) 동생인 임영대군이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와 자신까지 3대가 나란히 서자(庶子)였다. 어쨌거나 왕족이었기에 합당한 예우를 받았다. 생활은 풍족했으리라.
이정은 한국 회화사에 있어서 최고의 묵죽(墨竹) 화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전쟁(壬辰倭亂) 중에 팔에 큰 상처를 입었다. 거의 못 쓰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나중에 치료가 다 되었다고 전한다. 서른 아홉의 나이 때였다. 이후로 이정은 최고의 작품을 그린 화가로 찬사를 받았다.
지난 6월 마지막 주, 뭣 하나 부러울 것 없어 보였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연일 뉴스에 ‘구속 여부’를 두고 화제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다. ‘뭣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팔자(八字)가 있긴 있다. 다음이 그것이다.
生長綺紈祿之終身 (생장기환녹지종신)
나면서부터 비단 강보에서 성장하고 복록(돈 걱정 없는 삶)을 죽을 때까지 누린다, 라는 뜻이다.
이런 팔자를 온전히 누렸던 사람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과연 진실에서는 얼마나 되겠는가. 범인(凡人)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그들도 숱한 인생의 고비가 수 없이 뒤따랐을 것이다. 엄청난 부자, 그들이라고 해서 왜 고난이 하나도 없었겠는가.
내 손수레는 내가 무엇을 담아냈는가에 달렸다. 좋은 시 한 편과 유명한 그림을 번갈아 비교하면서 여름 무더위를 한 방에 날리려는 내 팔자를 견주자면, 난 남들이 부럽지 않다. 스스로 생각하건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다.
중국 북송(北宋) 시인 소동파(蘇東坡, 1037~1101)가 그랬던가. “대나무 그림은 반드시 가슴에 먼저 대나무를 담아내야 얻을 수 있다(畵竹必先得成竹於胸中)”라고.
외발의 손수레에 무엇을 담아내 생(生)을 건너고 나를 것인가. ‘대밭’이 되거나 ‘대숲’이 되고의 한 끗 차이는 아버지와 달리 아들인 내 흉중(胸中)에 품은 그 선택에 오로지 달렸다. 도시를 먼저 그리면 대숲이 되고, 시골을 먼저 생각하면 대밭이 되는 것이다.
사랑이나 행복 등도 그럴 것이다. ‘나, 행복해요~’라고 먼저 말하자. 말한 대로 언제나 그 결과가 생기는 법이다. 인생살이도 내 맘 먹기다. 다 그렇다. 바람(風)이 담긴 대나무 그림을 보면서 내 바람(願)을 같이 크게 불어 보자.
그나저나 이정의 풍죽 그림엔 대나무가 모두 넷이다. 저걸 두고 ‘대밭’이라고 해야 맞나, 아니면 ‘대숲’이라고 해야 되는가. 바람을 타는 ‘나’의 선택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나.
아무튼 칠월의 밤은 한낮과 별반 다를 게 없다. 후덥지근하다. 중국 남송 시인 양만리(楊萬里, 1124~1206)의 <여름밤 서늘함을 찾아서(夏夜追涼)>라는 한시(漢詩) 한 수로 무더위를 식혀나 보자.
夜熱依然午熱同 (야열의연오열동)
開門小立月明中 (개문소립월명중)
竹深樹密蟲鳴處 (죽심수밀충명처)
時有微涼不是風 (시유미량불시풍)
밤인데도 여전히 한낮 열대야
문 열고 잠시 달빛 아래를 서성이네
대숲 빽빽한 안쪽에서 벌레가 우는데
잠시 서늘함 일렁거리나 바람은 아니라네
한시의 앞뒤 글자를 머리와 꼬리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夜中竹風(야중죽풍)’이란 네 글자가 도드라지게 보인다. 밤중엔 역시 대숲에서 부는 바람이 단연 최고다. 멀리 갈 것 없다. 가까이에 <풍죽도> 그림을 눈 앞에 두자.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주는 시원함이 아니라 가슴에 일렁이는 청량함이 생겨날 것이다. 어쩌면 그림이 무더위에서 ‘나’를 지켜낼 것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참고문헌
문태준 <그늘의 발달> (문학과지성사, 2008)
임희숙<그림, 시를 만나다> (이담북스, 2018)
손철주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 (효형출판, 1998)
주조모 엮음, 이동향 역주 <송사삼백수> (문학과지성사, 2011)
이병한 엮음 <하루 한 수 한시 365일> (궁리, 2007)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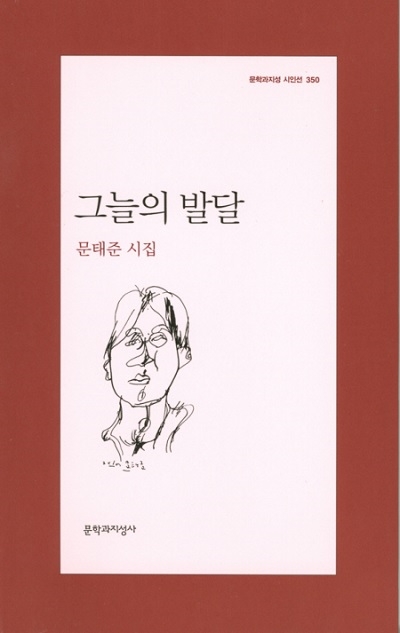







![[뉴욕증시] 인도와 무역합의 기대감에 상승](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5043005235102053be84d876741182211201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