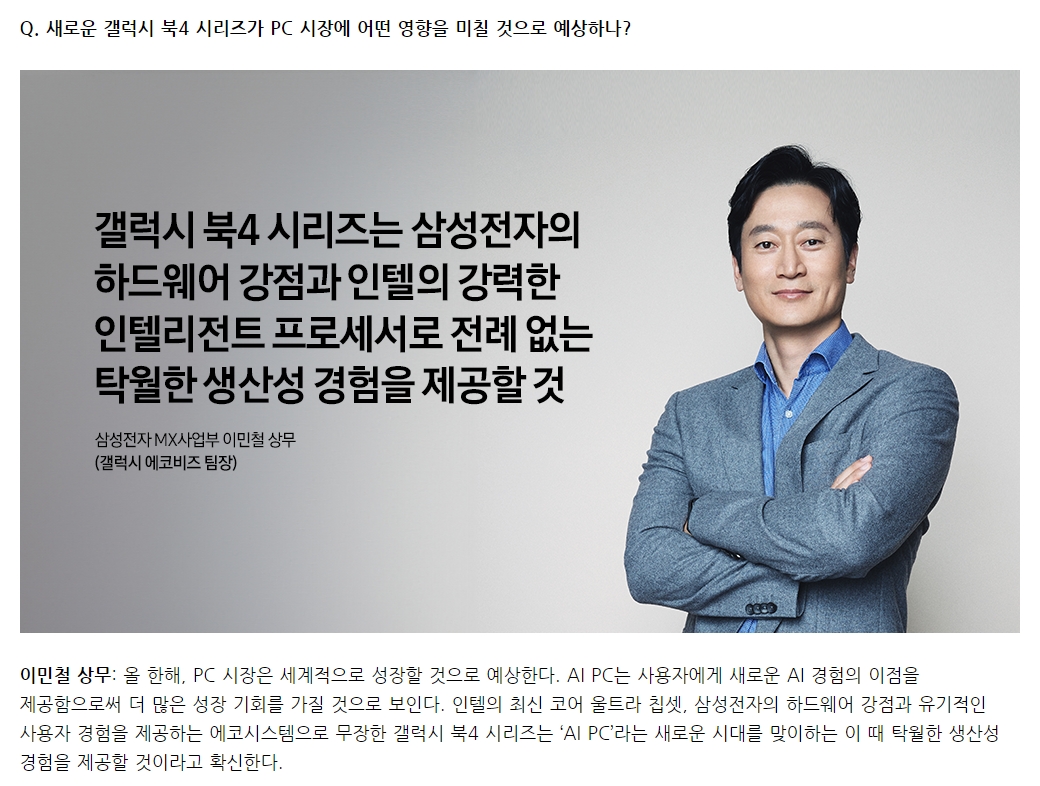생성형 AI 붐 일자 PC에 NPU 탑재 유행
지난해부터 'AI PC' 앞다퉈 출시
하지만 대부분 MS '코파일럿+' 기준 미달
5월 퀄컴 칩 탑재 제품만 코파일럿+ 지원
지난해부터 'AI PC' 앞다퉈 출시
하지만 대부분 MS '코파일럿+' 기준 미달
5월 퀄컴 칩 탑재 제품만 코파일럿+ 지원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지난달 21일, 퀄컴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스냅드래곤 X 엘리트/플러스를 탑재한 코파일+ PC 22종을 공개했다. 이것은 노트북과 생성형AI가 하나로 결합된 첫 번째 노트북 라인업이란 점에서 업계에 일대 주목을 받았다.
같은 날(현지시각 20일),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미국 시애틀 본사에서 개최한 미디어 콘퍼런스에서 '코파일럿+(Copilot+) PC'라 이름 지은 AI 컴퓨터를 공개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코파일럿+ 지원 노트북이 "맥북에어보다 인공지능 작업 처리 속도가 58% 뛰어나다"며 애플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제품의 출시는 2023년 혹은 올해 상반기에 판매된(정확히는 5월 20일 이전 판매 모델) 제품을 구매한 이들의 실망감을 키웠다. MS가 퀄컴과 손잡고 코파일럿+를 밀기 시작한 시점에서 올해 상반기에 판매된 모든 노트북과 PC는 '급이 다른' 구 모델이 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출시한 2024년형 노트북을 홍보할 때 'AI PC' 내지는 'AI 노트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LG전자는 지난해 12월 'LG전자, 최신 AI CPU 탑재한 2024년형 LG 그램 판매 시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이번에 선보이는 LG 그램 신제품에는 기존 CPU와 달리 생산방식에서부터 구조까지 완전히 바뀐 인텔의 차세대 프로세서인 인텔 코어 Ultra CPU가 적용됐다. 인텔 코어 Ultra CPU는 인텔 칩 가운데 최초로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 신경망처리장치(NPU) 인텔 AI Boost가 내장돼,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자체 AI 연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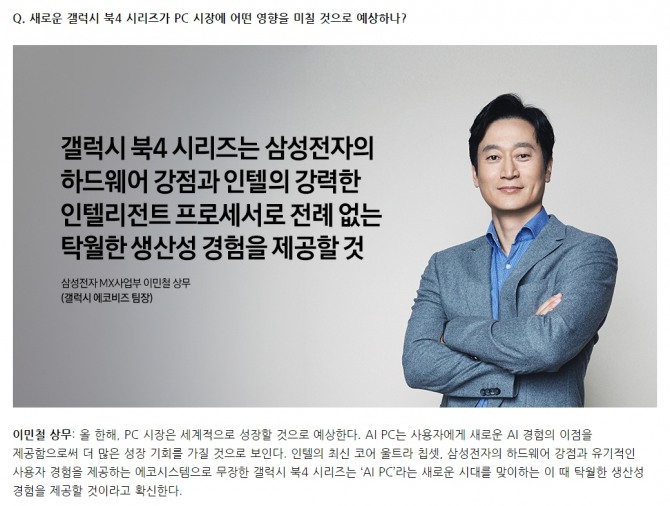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삼성전자도 2월 26일부터 갤럭시북4 울트라(Galaxy Book4 Ultra), 갤럭시북4 프로(Galaxy Book4 Pro), 갤럭시북4 프로 360(Galaxy Book4 Pro 360) 등 갤럭시북4 시리즈를 출시했다. 삼성전자도 보도자료를 통해 "갤럭시 북4 시리즈는 새로운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Intel Core Ultra Processor)를 탑재해 다양한 AI 기능까지 구현하며, 사용자에게 더욱 강력한 컴퓨팅 경험을 선사하는 등 최첨단 기술로 무장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자사 뉴스룸에 갤럭시북4 시리즈의 탄생 과정에 참여한 삼성전자 이민철 상무와 인텔 데이비드 펭 부사장의 인터뷰까지 실으며 새로운 'AI PC'를 강조했다.
이 같은 사정은 에이수스나 레노버 등 다른 PC 업체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부터 생성형AI 열풍이 거세게 불어닥쳤고 생성형AI를 위해서는 하드웨어에 AI 작업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신경망처리장치(NPU)가 필수가 됐다.
AI 반도체라고도 불리는 NPU는 학습 및 추론 등 AI 관련 핵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 연산 처리를 저전력으로 고속처리해 효율성을 높인다. 기존 GPU로 처리하고자 하면 고전력과 더 많은 GPU 내장에 따른 고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마침 인텔의 최신·최고급 CPU인 메테오레이크 코어 울트라 하드웨어에 AI 작업을 가속화할 수 있는 NPU가 내장돼 있기에 PC 업체들은 이 CPU를 탑재한 제품을 'AI PC'로 포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1세대 'AI PC'는 NPU가 탑재돼 있을 뿐, 너무 느린 AI 성능을 지녔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텔 NPU는 10TOPS(초당 1조번 연산) 속도, AMD의 NPU는 최대 16TOPS 속도를 낸다. 둘 다 MS의 코파일럿+ PC의 기준이 되는 '최소 40TOPS'를 충족하지 못한다.
반면 퀄컴은 스냅드래곤 X 엘리트 NPU의 AI 성능이 45TOPS라고 밝혔다. MS가 인텔·AMD 대신 퀄컴과 손잡고 '코파일럿+ PC' 22종을 공개한 이유다.
현재로선 이 '코파일럿+ PC' 22종을 제외하면 MS의 코파일럿+를 사용할 수 없다. 기존 코파일럿이 챗봇 형태로 이용하는 웹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였다면, 코파일럿+는 PC는 윈도우 운영체제에 특화된 AI 기능을 제공하기에 사실상 MS의 'AI PC'는 '코파일럿+'라 할 수 있다.
결국 'AI PC'라는 마케팅 용어에 현혹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2024년형 노트북을 구매한 소비자는 비싼 값을 지불하고 바로 구 모델이 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셈이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