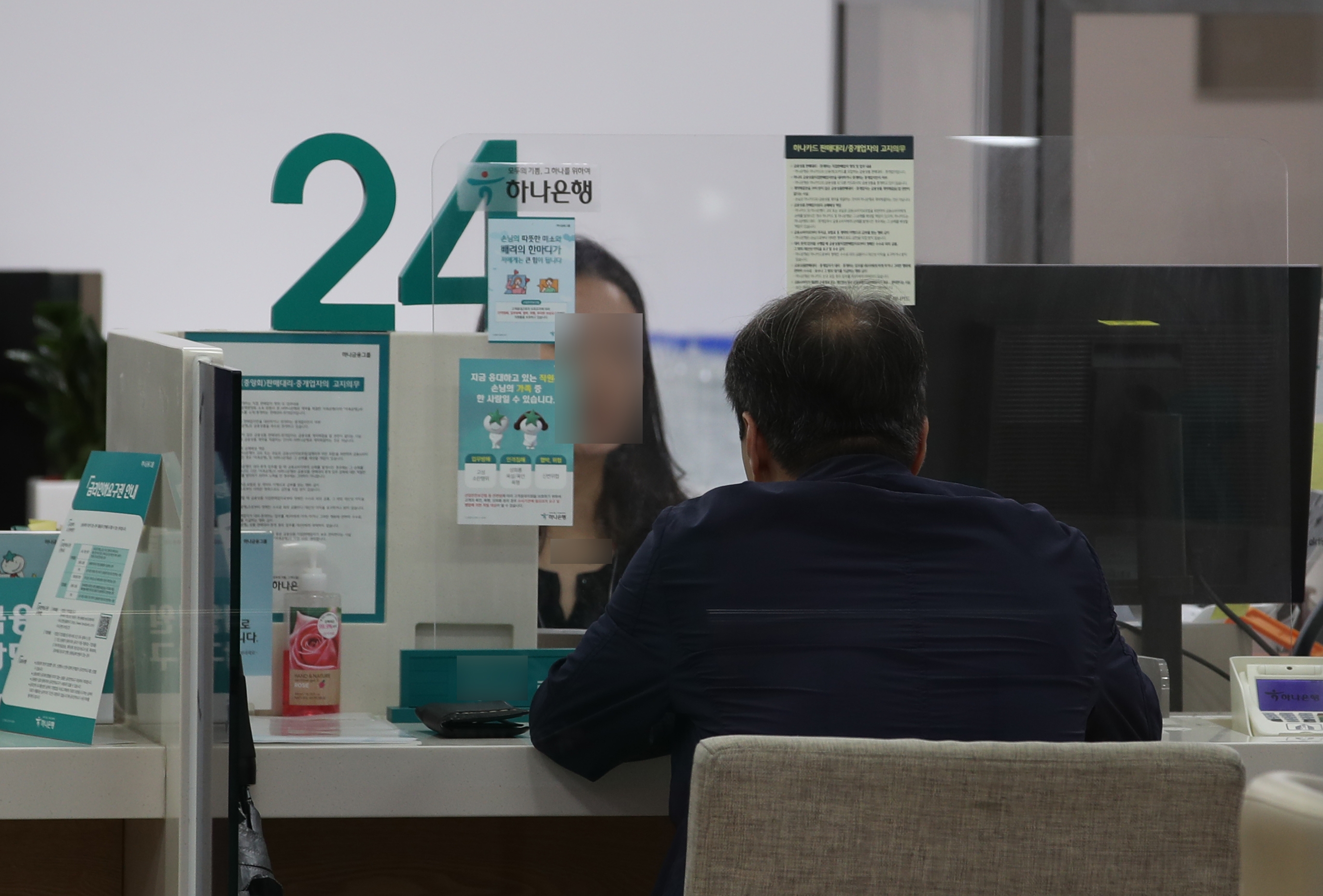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금융당국이 은행 금리 결정에 개입하면서 서민들이 미국발(發)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관치금융의 역설’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빅컷(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을 단행하면서 추가 하락이 예상되던 대출금리는 상반기보다 아직 높은 수준이다. 오히려 시장금리 하락으로 예금금리는 대폭 내렸지만 당국의 개입에 ‘서민은 울고, 은행만 웃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고정형 또는 주기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지난 20일 평균 3.187%로 집계됐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이미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달 5일 3.101%까지 내렸다. 이후 3.2%대에서 주로 머물다가 연준의 피벗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지난 13일 3.145%까지 내렸고, 피벗이 확정되면서 3.1%대에서 머물고 있다. 이는 3.8~3.9%대에서 움직이던 연초와 비교하면 금리가 상당 폭 내렸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3.5%)보다도 0.4%포인트(p)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변동형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도 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렸다.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3.42%)보다 0.06%p 하락한 3.36%로 집계됐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6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세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이들 은행이 실제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하는데 코픽스가 하락했다는 것은 은행들의 조달 비용이 낮아졌다는 의미다.
지표 금리들이 내리면서 주담대 금리도 소폭 내렸지만, 오히려 8월 초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지난 20일 기준 주기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850∼5.633%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연 3.850∼5.736%)과 비교하면 금리 상단이 0.103%p 내렸지만 6월 28일(연 2.94~4.95%)보다는 1%p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 당시는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3.493%로 지금보다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낮았던 셈이다.
시장금리가 대폭 내렸지만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압박 탓이다. 7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은행들은 시장금리 하락에도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수요를 억제하고 나섰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춰 쉽사리 가산금리 인하를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는데 예금금리는 시장금리를 즉각 반영해 내리면서 은행 수익성만 좋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를 염두에 두고 일부 수신상품 금리를 최대 0.2%p 인하했다. 같은 달 5일 KB국민은행도 일부 수신상품의 금리를 최대 0.2%p 내렸고, 14일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최대 0.2%p 인하를 결정했다. 지난 9일에는 케이뱅크가 수시입출금통장인 생활통장의 금리를 3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종전 2%에서 0.1%로 대폭 인하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내렸다가, 그쪽으로 대출수요가 쏠리면 가계부채 관리를 잘못했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면서 "당국이 금리를 내려라 올려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정책 초점이 가계부채 관리에 맞춰져 있는 만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