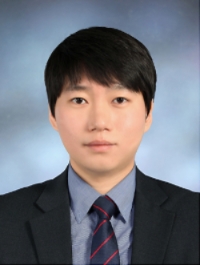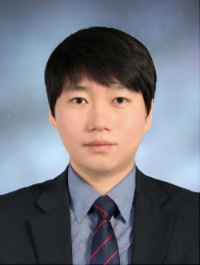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금리상승기를 틈타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뒀지만 고액 연봉, 성과급 잔치 등 노골적인 '잇속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어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시중은행 총급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각사 직원 평균 총급여(성과급 포함)는 처음으로 모두 1억원을 넘었다. 직원 상위 10% 평균연봉은 2억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은행들이 최근 기본급의 300~400%에 달하는 성과급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평균 급여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16만4000원 늘어나는 것으로 산출됐다. 2021년 8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기준금리는 지난해 말까지 무려 2.75%포인트 올랐다. 이 기간 동안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180만4000원 증가한 셈이다.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늘었지만 지난해 금리 상승으로 예대마진이 벌어지면서 상위 8개 은행의 이자이익이 전년도보다 8조원 이상 많은 53조원를 넘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기업이 경영 성과가 좋아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난해 치솟는 이자에 서민들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이자이익을 올린 은행권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은행들 스스로 비판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코로나 방역조치 해제로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됐지만 "고객과 은행원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아직도 은행 문은 30분 늦게 열고 일찍 닫고 있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것은 2021년 7월 12일부터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고 그해 10월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하지만 지난해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고 9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은행 영업시간은 여전히 원복되지 않고 있다. 고객과 은행원 모두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발길을 돌리는 고객들의 불만이 잇따르면서 은행원들만을 위한 단축 영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러한 소비자를 외면한 잇속 챙기기에 은행업 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예대마진 법제화 주장에 이어 심지어 정치권에서는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까지 거론된다.
하지만 국민 정서에 기반한 섣부른 규제 도입과 당국의 개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예대금리차를 줄이라면서 공시제도까지 마련하며 은행들의 예금금리 인상을 부추겼다. 이후 은행권으로 시중 자금이 쏠리자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이번엔 "대출금리는 다시 오르는데 예금금리는 내린다"는 비판이 일자 대출금리 추이를 매주 점검하며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다.
당국의 섣부른 개입에 시장의 혼선은 커졌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 소비자 몫이었다.
결국, 최근 커지고 있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정치권과 당국의 개입 명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벌어 들인 만큼 베푸는 은행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요구된다. 정부가 민간 소유인 은행들에게 과도하게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의 라이선스로 보호받는 시장이고 과거 부실 사태 당시 대규모 혈세가 투입된 만큼 다른 산업보다 공적 책임이 무거운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