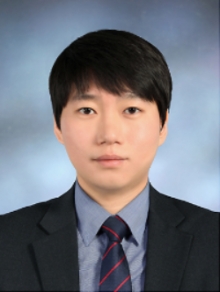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면서 "결국 우리 (금융)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금융당국 수장이 주요 금융지주들에게 국회에서 논의 중인 '횡재세'(초과이윤세)를 피하는 게 낫다며 알아서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셈이다.
실제 금융지주 입장에서도 자발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1조원 규모 상생금융안을 발표해 횡재세를 피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당론으로 발의한 횡재세 법안은 5년 평균 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수익에 최대 40%의 부담금을 물려 서민 금융 지원에 쓰자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예상 환수액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반시장적 입법을 막기 위해서 정부의 어떠한 반시장적 개입도 정당화될 순 없다. 주요 금융지주들은 대부분 상장회사이면서 엄연히 주주들이 있는 민간 기업이다.
특히 주주 대부분이 외국인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반시장적 환경을 극도로 싫어한다. 가뜩이나 만년 저평가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국내 금융주가 더 외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은행들의 막대한 이자이익이 '과점체제' 탓이라고 보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장려한 건 정부다. HSBC, 씨티은행 등 한국 시장에 진출했던 세계 유수 상업은행들은 정부의 노골적인 관치금융에 치를 떨고 떠났다.
이쯤 되면 금융권 일각에선 차라리 횡재세 도입이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의 난데없는 '종노릇' '갑질' 비판에 숙제 검사 받듯이 상생금융 재원을 마련하느니 법에서 규정된 세금을 납부하는 게 편할 수도 있다는 볼멘소리다.
'자율적'이란 말은 스스로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당국이 금융권에 요구하는 자율적 상생금융안은 '삥을 뜯는데 금액은 알아서 성의 표시해라'는 의미로 들릴 수밖에 없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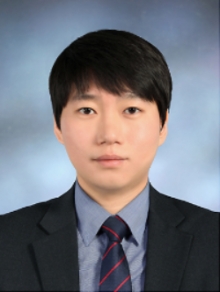










![[서울모빌리티쇼] 넥쏘·PV5·제네시스 컨버터블 콘셉트 등 눈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315445608370112616b072175213103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