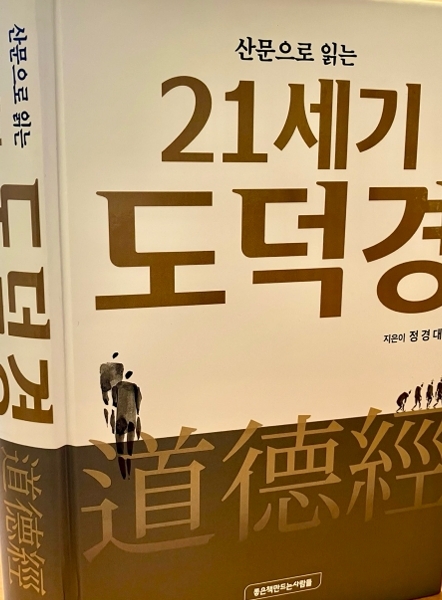'산문으로 읽는 21세기 도덕경' 제14장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색깔이 없고, 희귀하고, 미세한 것이 혼합되어 모양을 알 수 없는 그것(道)의 위는 어둑어둑해 밝지 않고 그(道) 아래는 희끄무레해서 무엇이라 분별할 수 없는 것이 무궁무진해 이름을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것(道)에서 탄생한 만물은 다시 아무것도 없는 그곳(道)으로 돌아가는데 알 수 없는 그 모양을 황홀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환상적인 그 무엇을 보았을 때를 상상해볼 수 있다. 가장 실감 나는 황홀경은 깊은 명상에 들었을 때의 광경이다. 그것은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하고 황홀할 뿐이라는 말밖에 문자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거기에서 더 집중해 완전한 삼매(三昧)에 들면 자아마저 사라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문득 여러 현상이 나타난다. 그 현상이 과거 전생일 수도 있고 먼 훗날의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또 어떤 경지에서는 거대한 산과 신비로운 숲이나 바다 건너 세상이 환히 보였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노자가 명상의 깊음이 더 깊고 깊은 삼매에서 경험한 황홀에서 이·희·미를 경험한 것은 아닐까 하고 상상해본다.
아마도 그럴 것 같다. ‘도에서 태어난 만물이 다시 도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말에서 그리 유추해볼 수 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고 한다. 돌아간다는 것은, 마치 타향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듯 왔던 곳으로 회귀한다는 뜻이다. 이 뜻은 불교의 윤회(輪廻) 사상과 같다.
노자도 '덕'편 50장에 윤회와 유사한 기록을 해놓았다. 출생입사(出生入死) 생지도십유삼(生之徒十有三)이라는 구절이다.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음으로 들어가는데 태어난 자 모두는 셋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셋은 삼위일체에서 셋이자 하나이며, 하나는 도다. 도(徒)는 무리라는 뜻이고, 십(十)은 완성 수로서 전부 또는 모두를 뜻하고, 유(有)는 많은 뜻풀이 중에서 업보를 뜻한다. 따라서 태어난 모든 무리는 죽어 도의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즉 처음부터 태어나면 반드시 도로 회귀하는 업에 따라 죽은 모두는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노자는 태어난 도의 곳을 또다시 이렇게 형용했다. 이(夷)·희(希)·미(微)한 도의 모양을 헤아려 보자니 머리가 보이지 않고 따라가자니 꼬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형용은 그 크기가 무한해 도무지 가늠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노자는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쓰고 14장을 끝맺었다. 옛날부터 전해 오는 도에 대한 그와 같은 모습을 살펴본 바가 있었으니, “그 옛날 만물이 생겨난 처음의 모양은 색깔이 없고, 그 무엇과도 유사하지 않아서 희귀했으며, 그 '정기(精氣)'는 미세하고 미세하여 만질 수도 없었으니 이것을 일컬어서 천지 만물의 기원이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물질의 최소 단위인 소립자를 생각해볼 수 있다. 아무리 큰 바위도 그 크기의 시작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소립자가 쌓이고 쌓여서 거대한 바위가 되었다. 그리고 그 바위를 부수면 반드시 시작된 처음 소립자 하나로 회귀한다. 끝으로 참고할 점은 유는 무에서 시작되고, 무는 유에서 시작된다. 즉 하나와 제로는 맞물려 있어서 하나의 끝은 제로이고 제로의 끝은 하나라는 사실이다. 땅끝이 바다의 시작이고, 바다 끝이 땅의 시작이므로 땅과 바다가 맞물린 점이 제로이자 동시에 시작과 끝인 것과 같다. 양자역학이 이런 뜻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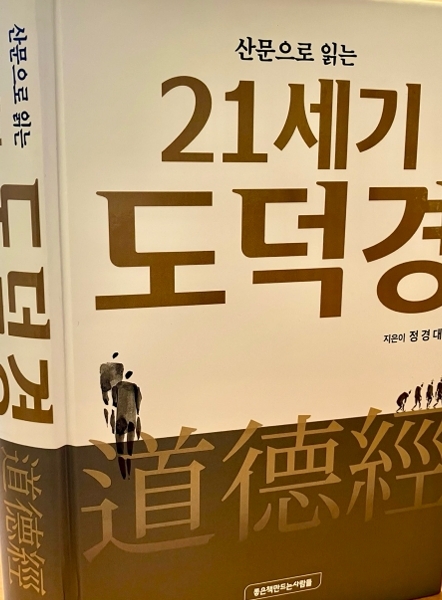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정경대 한국의명학회 회장(종교·역사·철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