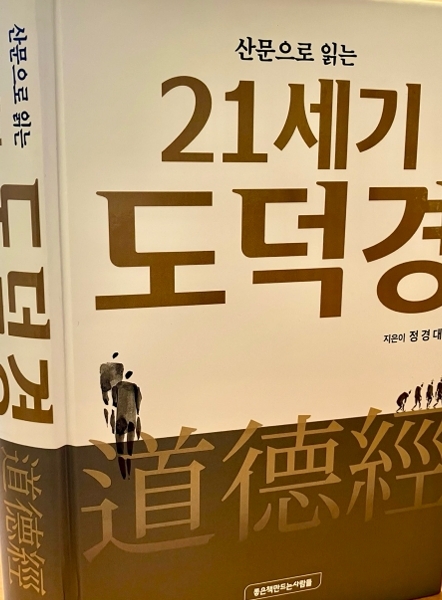'산문으로 읽는 21세기 도덕경' 제15장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노자는 득도한 그 선비들의 초월적 능력이 미묘하고 현통하여 앎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에 대해 말하기를, 덕을 베풀 때의 몸가짐은 얼어붙은 냇물을 건너듯 조심스러웠으며 사방 이웃을 지극히 겸손하게 예로써 대했다. 그뿐만 아니라 공손하고 삼가는 자상한 모습은 얼음이 녹듯 부드러웠으며, 덕을 베풀 때는 꾸밈없이 순박하고 만물을 길러주는 골짜기와 같았다고 했다.
골짜기는 만물을 낳고 길러주는 곡신을 일컬음이다. 곡신은 골짜기 샘물이 흘러 강물이 되어 대지를 적시고 만물을 낳고 자양하는 것과 같다. 그처럼 득도한 성인은 만물을 무위로 낳고 길러주는 도와 같이 덕행을 실천하는 존재임을 그리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 노자는 뒤이어 "(도)는 밝음과 어둠이 뒤섞여 흐릿한데 누가 능히 흐릿함을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게 할 수 있는가?" 하고 물었다. 이 말뜻은 도가 만물을 태생할 때 어둠과 빛이 갈라지지 않은 새벽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성인의 마음은 무엇을 분별해 차별하거나 다급히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끝으로 노자는 "누가 능히 안정되게 움직여 덕이 서서히 자라나게 할 수 있는가?" 하고 의문 섞인 질문을 했다. 이 의문의 정답은 도다. 그리고 동시에 성인을 가리킨다. 도가 만물을 낳을 때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게 하듯 성인이 예에 어긋나지 않게 공손한 몸가짐으로 조용히 덕을 베풂을 뜻한다.
계속해서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도의 덕을 지키고 보전하는 이는 덕을 넘치게 베풀려는 욕심을 내지 않는다고. 만약 도가 급하게 그리고 넘치게 만물을 생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마치 폭우가 급하게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것과 같다. 이 구절의 뜻은 세상사에 큰 교훈을 준다. 일할 때 급히 서두르거나 너무 느리게 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그러나 알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 바로 금은보화 재물이다. 재물이 복에 넘치게 많은데 더 채우려고 발버둥 치면 반드시 해를 입는다.
넘치게 많다는 뜻은 비단 재물만을 뜻하지 않는다. 지식·지혜·언행 등도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를 본다. 성인이 좋은 말로 백성을 교육할 때 폭풍처럼 급하게 말을 쏟아내고 무리하게 덕을 베풀면 백성은 교훈을 다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래서 노자는 뒤에서 이렇게 말했다. 많이 알고 말이 많은 자는 알지 못하여 최하이고, 알면서 모르는 체 말이 없는 자는 실은 다 아는 자로서 최상이라 했다. 노자는 이 장의 마지막 구절을, (도)가 낳은 자연은 더 채우려고도 하지 않고, 새롭게 이루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도는 항상 부족하면 채워주고, 남으면 덜어줄 뿐 욕심내 더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가뭄이 심하면 비를 내려 연못을 채워주고, 연못이 가득 차면 비를 그쳐 넘치는 물을 덜어준다. 그리고 이미 만물이 온 누리에 가득한데 굳이 새롭게 이루고 한가득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탐욕을 버림이 도를 따르는 것’임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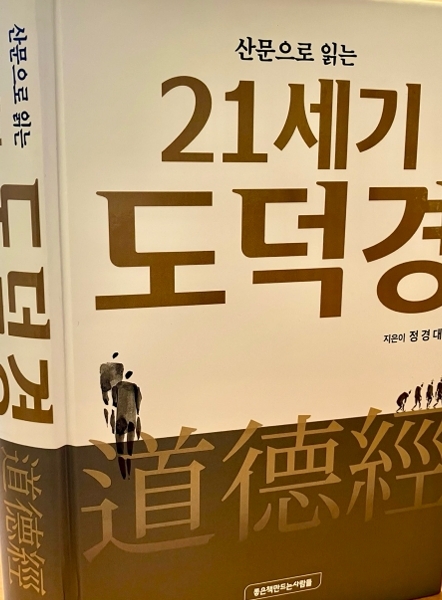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정경대 한국의명학회 회장(종교·역사·철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