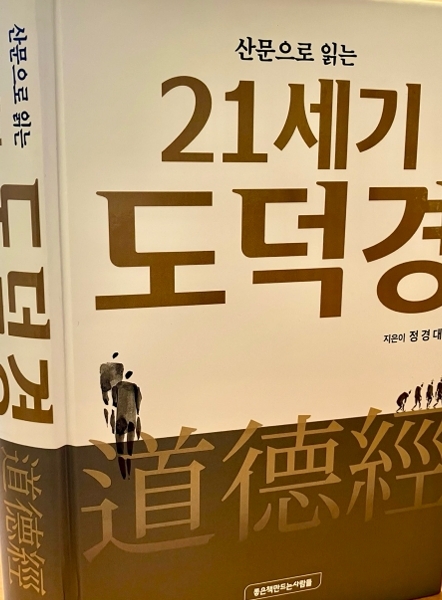'산문으로 읽는 21세기 도덕경' 제19장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얼핏 듣기에 쉬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 역시 위선 없는 무위(無爲)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 본래 인과 의가 없었기 때문에 규범을 정한 작위적 인의이기 때문이다. 규범이란 지식에 매이면 많이 앎에 도취돼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랑은 교만이 따르고, 교만은 위선과 아집을 발현한다. 인위적 미덕은 악을 담는 그릇이라 한 것도 그 때문이다. 어질고 의로운 언행을 무위로 함이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라 할 것이다.
사람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라 할 유학의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은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사람의 도리가 무너지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자가 내세운 작위적 규범이다. 문자나 말로써 인의를 깨달았으면 인의란 지식을 버려야 한다. 순수한 본성에 충실해 무위로 행하는 인의가 아니면 언제든 자식은 불효하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말했다.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백성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인의를 끊으라는 뜻은 인의를 저버리는 배은망덕이 아니라 인의라는 지식에 얽매여서 억지로 처신하지 말고 무위로 하라는 뜻이다. 공자의 그 주옥같고 환상적인 교훈은 도리가 무너진 인간의 이기적 속성을 바로잡기 위한 거룩한 지식이다. 그 지식을 무위로 지키면 이 세상은 다툼이 없이 오직 평화롭기만 하고, 사람사람이 행복하여 그토록 그리운 유토피아가 이상적인 꿈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이 아무리 많고 많아도 부귀공명에 자아를 상실한 인성을 도리에 맞게 되돌리지 않는 한 그런 이상향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지식 중에서도 불인, 불의 그리고 탐욕과 이익을 위한 교묘한 수단을 부리지 말 것을 교육하는 갖가지 지식을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인성이다.
그러므로 노자가 말했다. "인의와 이익을 멀리하고 교묘한 수단을 부리지 않으면 도적이 없어진다."
인의, 이익, 교묘한 수단, 이 셋을 버리기는 참으로 어렵다. 작위적인 인의도 버려야 마땅하지만, 이익을 취하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도 버려야 한다. 특히 탐욕에 이성을 잃고 부리는 교묘한 수단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악하다. 그런 자들은 속으로 품은 음흉한 욕망을 교묘하게 위장하고 인의를 저버리는 자들을 분개한 목소리로 비난한다. 그렇게 이익의 대상에게 자신의 의로운 모습을 각인시키고는 때가 이르면 숨겨둔 욕망의 발톱을 서슴없이 드러낸다.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 파멸의 나락에 떨어진 상대를 조금도 가엽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욕망을 채운 만족감에 쾌재를 부른다.
그런 자들의 부도덕성은 예로부터 현세까지 그친 적이 없으니 그런 자들은 권력과 재물 등 제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원혼들이 죽어 없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 한풀이 한마당을 펼치는 것 같다. 하지만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 법, 이에 노자는 "하늘의 도는 촘촘한 그물처럼 펼쳐져 부도덕한 것은 걸러내고 도리에 맞는 것만 거둔다"라고 했다. 그러한 하늘의 도는 인과응보라는 현묘한 이치를 끊임없이 시행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꾸미지 말고 선의에 대한 욕심일지라도 조금만 내야 한다."
선의란 착한 마음이다. 착한 마음일지라도 무위가 아니면 위선이 될 수 있다. 과한 선의는 자기희생이 따르기 마련이고, 자기희생은 언제든 무위한 진심을 기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니고 싶거든 소박하게 부족한 듯 욕심을 내라"는 말을 끝으로 19장을 끝맺었다. 세상에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너 나 할 것 없이 지니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업이 아닌 악업의 종자가 되는 도둑의 심보로 다 가지려 하지 말고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번뇌 없는 행복이며, 참 도인의 심성으로서 천지의 도를 따르는 선행이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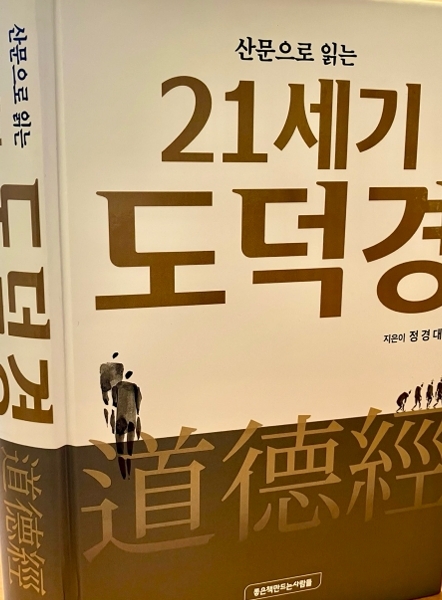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정경대 한국의명학회 회장(종교·역사·철학박사)